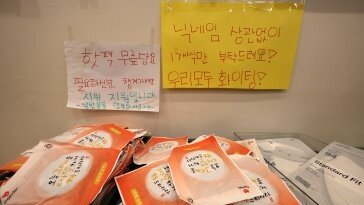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의 통 큰 기부가 새해 벽두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2001년 300억 원을 KAIST에 기부한 데 이어 다음 주 215억 원을 쾌척하기로 했다. 그가 기부한 총액 515억 원은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으로는 류근철 한의학 박사(57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도 범상치 않은 행보를 했다. 반도체 관련 미래산업을 창업하고 벤처기업 10여 개에 투자해 ‘벤처업계 대부’로 불렸다. 그리고 2001년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후임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정 전 회장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기부 소감은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다. 전셋집에 살면서 큰돈을 기부할 때 망설임과 고민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만족해했다. 그가 기부금을 써 달라고 지정한 분야는 미래전략과 뇌과학이다. KAIST는 이 돈으로 미래전략대학원을 세워 국제관계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같은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뇌과학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는 분야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에도 연구원이 많지만 외교 국방 경제 국토개발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곳은 드물다. 더구나 일부 연구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이런 국책 연구기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부가 한층 더 아름다운 이유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1/13062497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