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애인 탓이라고 생각했다. 생후 삼 개월도 안 된 강아지를 분양받아 와 ‘이건 우리 사랑의 징표 같은 거야’라고 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애인이었다. 나처럼 우리 강아지도 사랑해줘야 해. 그녀는 그런 말도 했었다. 그런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는 자신에게로 온 강아지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대형마트 농수산물 코너에서 일하면서, 월세를 내고 카드빚 갚느라 쩔쩔 매면서도 몰티즈에겐 꼭 유기농 사료를 먹였고, 소프트 슬라이스와 고구마치킨 같은 간식도 꼬박꼬박 잊지 않았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자취방에 돌아오면 강아지의 온기만이 그를 위로해주곤 했다. 강아지는 그가 쓰읍, 하고 화난 척을 하면 마치 두 발로 걷는 사람처럼 뒷다리로만 서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고, 그러고도 그가 계속 화난 표정을 풀지 않으면 슬금슬금 다가와 천천히 무릎을 핥아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강아지를 꼭 껴안아주었다. 그에게 강아지는 애인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난 일에 불과했다. 그는 2주에 한 번씩 쉬는 날에만 애인을 볼 수 있었는데, 애인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다(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너는 오이나 당근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오이나 당근을 질투한다고 여겼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니, 어느새 그들 사이엔 양파 더미보다 더 높은 벽이 생겨버렸고, 그로부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애인으로부터 결별 선언이 당도하였다. 그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때부터 그는 자취방에 있는 강아지를 보기가 괴로워졌다.
거 누굽니까?
개 줄을 경계석에 막 묶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그는 당황해서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관리인인 듯한 남자가 눈을 맞으며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경계석에 묶인 몰티즈가 꼬리를 치며 관리인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다.
거 뭐하는 겁니까?
그러자 강아지는 버릇처럼 그의 옆에 두 발로 섰다. 앞다리는 가슴 쪽에 살포시 모은 채.
저기, 그러니까 기도, 기도를 하려고요….
그는 쪼그리고 있던 다리를 땅바닥에 대고 더듬더듬 그렇게 말했다. 관리인이 그와, 그의 개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그 와중에 몰티즈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무릎 대신 손등을 핥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기도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기호 소설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기호의 짧은 소설]어느 대리기사 이야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2/26/6120637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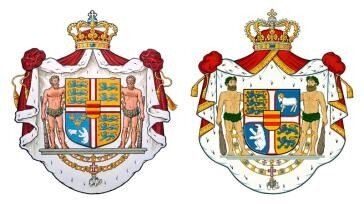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