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인왕산 둘레길을 걸을 때면 자꾸 발밑을 보게 된다. 인왕산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꽃이 제비꽃이기 때문이다. 제비꽃이 무리지어 피었던 곳을 더듬으며 여기저기 들여다보지만, 쑥 냉이 돌나물만 보일 뿐이다. 여러 번 그러길 반복하다 제풀에 지칠 때쯤이면 제비꽃 천지가 되어 있어 화들짝 놀라게 될 것이다. 매년 그랬으니….
혹독할 거라 예고했던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인지 하루 종일 햇볕을 받는 곳에 있는 매화나무 꽃봉오리에는 붉고 흰빛이 살짝 보인다. 딱딱한 산수유 봉오리에서도 기필코 ‘노란빛이 돌고 있다’ 믿으며 계절을 앞질러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은 딱히 봄을 기다린다기보다 지루한 일상 속으로 봄바람처럼 불어올 신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2월은 우리의 눈이 지루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달이다.
인왕산 아래 살기 시작한 지 이십 년이 훌쩍 넘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인왕산을 걷지만, 요 며칠 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옷깃 속에 목을 넣고 걷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들고 활달하게 걷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연일 비슷비슷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햇빛이 다르고, 내일은 그 느낌이 더할 것이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앙상한 나무에 눈길을 주다가 한두 가지를 꺾어 들고 봄이 어디까지 왔는지 눈여겨보곤 한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인왕산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는 그 축복을 한껏 느끼며 꾸준히 걷는다. 인왕산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욤나무를 봤을 때는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되기도 했다. 옛날 어딘가에 갔을 때 검버섯이 핀 농부의 큼직한 손이 질항아리에서 고욤을 한 그릇 퍼 줬던 기억이 났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끝내 기억해 내지 못했다. 다 생각나지 않는 추억들은 열린 입구만 본 꿀단지 같아 더 애틋하다. 그 뒤에도 나는 인왕산에서 다른 고욤나무를 발견했고, 추억은 더욱 애틋해졌다.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려는 듯 벌써 딱따구리가 나무를 뚫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다. 장끼와 까투리도 보았다. 햇볕이 내리쬐는 숲에 앉아 오래도록 낙엽을 뒤지던 꿩들은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세상없이 느긋해 보였다.
변화 많은 세상에 나처럼 산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진다. 몇 년째 그 길에서 만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나는 눈인사를 하고 지나친다. 그녀가 풍기는 세련됨과 활기에 끌려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기도 한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그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의 건강과 평화를 바랐던 마음도 기도에 속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러고 보니,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도 같다.
조은 시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 칼럼/공경희]아들을 군에 보낸 어느 엄마 이야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3/08/61527289.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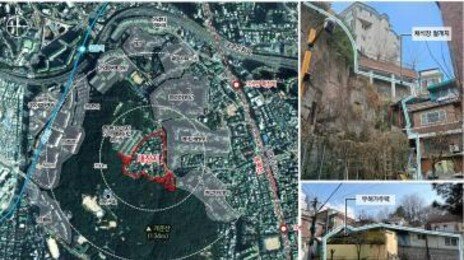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