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 앤드 칩스


영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같이 ‘영국 요리 맛없다’는 말을 상식처럼 주워섬긴다. 영국에 다녀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악평의 정점에 있는 피시 앤드 칩스(fish and chips)는 영국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 한국의 짜장면 수준이다. 그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영국 총 감자 생산량의 10%, 흰 살 생선의 30%가 피시 앤드 칩스를 만드는 데 쓰일 정도다.
사실 영국의 식문화가 고스란히 반영된 음식이 피시 앤드 칩스다. 영국은 일조량이 부족하고 토양이 척박해 야채나 향신료가 잘 나지 않는다. 영국인들을 먹여 살린 것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감자다. 그래서 영국의 살인적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감자 값은 관대하기 그지없다. 넘쳐나는 감자, 영국 연안 북해에서 흔히 나는 대구 명태 같은 흰 살 생선, 이 둘이 영국인들의 주식이 된 것은 당연했다.
이렇듯 영국의 전통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불만일까. 시작부터가 문제다. 런던의 히스로공항에 도착하면 알아듣기 힘든 영국 영어에 당황하고,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면 차표 값이 1만 원에 육박한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행 기분을 내려 펍(pub)에 들어선다. 왠지 모르게 의무적으로 피시 앤드 칩스를 시키면 한국 돈으로 3만 원, 게다가 1인분으로 나온 것을 몇 명이서 나눠 먹으니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일식집 생선가스처럼 튀김가루를 묻혀 바삭거리게 내기보단 대부분 동네 분식집처럼 밀가루 반죽에 평범하게 튀기는지라 ‘이걸 이 돈 주고 먹어?’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다.
그러나 피시 앤드 칩스는 맛없는 음식이 아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이태원이나 홍익대 앞에서도 피시 앤드 칩스를 팔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맥주 한잔을 할 때면 피시 앤드 칩스를 시키는 것을 보면 악평은 과장된 면이 있다. 자칫 무미할 수 있는 흰 살 생선을 튀겨서 기름진 맛을 더했고, 그것을 감자튀김과 함께 먹으니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튀김옷에 물 대신 맥주를 쓰기에 맥주와의 궁합도 좋다. 단순하지만 순하고 넉넉한 요리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레스토랑 팻덕(Fat Duck)으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영국인 셰프 헤스턴 블루멘설이 BBC와 함께 내놓은 ‘완벽한’ 피시 앤드 칩스 레시피를 써보자. 3kg이나 되는 자연산 광어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튀김옷 반죽에는 물 대신에 보드카와 맥주를 쓴다. 알코올은 열을 받으면 쉽게 증발해 튀김이 더 바삭해진다. 도수 높은 보드카를 쓰니 효과가 더 좋다. 밀가루만 쓰지도 않는다. 쌀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는다.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어 튀김옷에 찰기를 없앤다. 색깔을 내기 위해 꿀도 섞는다. 반죽이 가벼워지라고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생맥주 뽑듯 기계로 이산화탄소까지 집어넣는다. 이제 생선에 튀김옷을 입힌 다음 220도의 기름에서 노릇하게 튀기면 끝.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튀겨내는 것이 블루멘설의 또 다른 비법이다. 완성된 피시 앤드 칩스는 황금색에 아삭아삭거리는 튀김옷, 그리고 두툼한 생선살까지 갖춰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피시 앤드 칩스 좀 먹어봐서 아는데….”
: : i : :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필자(32)는 영국 고든 램지 요리학교 ‘탕테 마리’에서 유학하고 호주 멜버른 크라운 호텔등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정동현 셰프
정동현 셰프의 비밀노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정동현 셰프의 비밀노트]100년의 맛 간직한 ‘샐러드계 슈퍼스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7/09/6504288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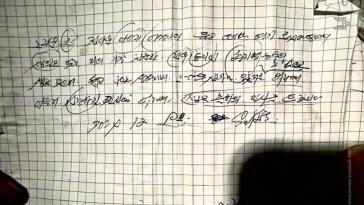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