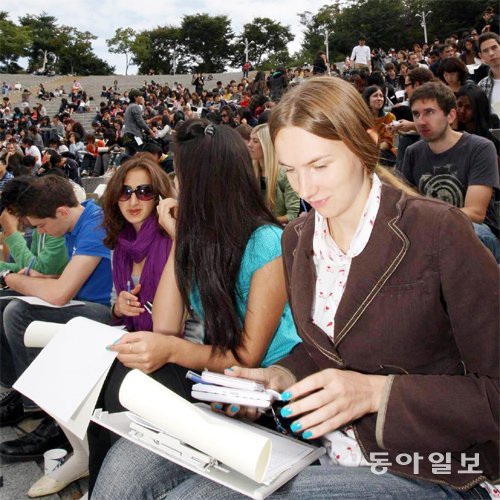

한국은 일본보다 윗사람을 대하는 말이 많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싸울 때도 간혹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는 식으로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싸움 중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일본에서는 싸움이 나면 존댓말은 거의 사라지고 반말로 싸우기 쉽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댓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태어난 생년월일을 묻는 것도 납득할 수 있다. 동갑이면 ‘몇 월생이냐’고까지 묻는다. ‘10월생’이라고 답했더니 상대방은 웃으면서 ‘나는 4월’이라며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을 슬쩍 펴는 듯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네 집에서 식사를 했을 때 일이다. 친구와 친구의 어머님 둘 다에게 “네”라고 대답했더니 친구는 “나한테는 ‘응’이라고 말해”라고 했다. 그래도 쉽게 구분해서 대답할 경황이 없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네’라고 대답했더니 친구는 재미있다며 웃었다.
‘네가’라고 한국말로 문장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해요’라고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할 때도 있었다. 존댓말과 반말을 뒤섞어 쓰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깨닫고 얼굴이 붉어진 적도 있다.
동갑이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친해질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몇 살 차이까지 반말이 괜찮은 걸까? 한 살 차이라면 무슨 말을 써야 하는 건지. 반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친해지지 않을까….
한국어는 어휘도 풍요롭다. 예를 들면, ‘붉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다. 표현이 많을수록 대화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
사람의 호칭도 그렇다. 친한 사람에겐 이름 뒤에 ‘씨(氏)’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빠’ ‘언니’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를 모를 때는 TV 드라마를 보고 ‘오빠’라는 말뜻이 모두 ‘사귀는 남자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진짜 남자친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한 연상의 남성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혈연관계의 오빠를 뜻할 때도 있다. 대화만 들으면 외국인으로서 관계를 알기가 어렵다.
상대방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자기야’와 ‘여보’란 단어도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처음에 ‘자기야’를 들었을 때는 ‘자기(自己)’를 뜻하는 말인 줄 알고 무슨 뜻인지 헷갈렸다. ‘여보’는 전화할 때 쓰는 ‘여보세요’와 같은 뜻인지 궁금했다.
그 외에도 ‘사장님’ ‘선생님’ ‘선배님’ 등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친구는 “일단 사장이라고 불러주면 실례할 일은 없다. 한국에서 이렇게 편리한 호칭은 없다”고 내게 말했다. 식당에 가면 손님은 가게에 있는 사람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가게 점원도 손님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쪽에서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외국인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위한 호칭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다. 일본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반대로 손님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손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다.
그렇다고 ‘오바상’(아줌마라는 뜻의 일본어)이라고 불렸다가는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것 같다. 언젠가 누가 내게 한국어로 ‘일본의 아.줌.마’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충격을 받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모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최소한 ‘아주머니’라고만 했어도 그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다. 여성의 심리는 참으로 복잡하다.
: : i : :
가와니시 히로미 씨는 한국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주부다. 한국에서 산 지도 3년째에 접어든다.
가와니시 히로미
히로미의 한국 블로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히로미의 한국 블로그]한국인의 융통성, 일본인의 깐깐함](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08/29/66084299.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