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서편, 흔히 ‘서촌’이라고 부르는 동네 끄트머리에 산다. 이 동네 집들은 소득수준이 다양하다. 중산층이 살기 좋은 소형 주택과 빌라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판잣집들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큰길가엔 한 블록을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넓은 대저택들도 있다.
한동네 안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과 아주 적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게 대견하긴 해도 여전히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대저택들은 높다란 담장과 조경수로 둘러싸여 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 아랠 지나가는 월급쟁이는 넘어서기 힘든 큰 장벽과 마주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전하기도 한다.
매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다. 지난달 나온 2014년판을 봤다. 이 보고서에선 부자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제외한 순수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라고 정의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엔 부자가 16만7000명 정도 있단다. 꽤 많은 수다.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운까지 따른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월급쟁이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애플, 구글 같은 잘나가는 글로벌 대기업엔 보너스를 제외한 연봉만 수억 원씩 받는 엔지니어와 관리자가 많다. 영업과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다. 월급만 받아서 중산층 이상의 부자가 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이들은 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많이 내지만 불만은 적다.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금융투자나 상속으로 재산을 모은 거부들은 더 많은 소득세와 재산세를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 정부는 일반 근로자는 임금을 늘리고 고액연봉자들은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법안마다 ‘고액연봉’의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사이다. 빈부격차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월급쟁이들이 ‘자산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고액연봉자라고 해서 꼭 재산이 많은 건 아니다. 또 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형, 부동산 투자형 자산가들은 놓아두고 아홉 중 하나밖에 안 되는 월급쟁이형 부자들만 털어 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진서 미래전략연구소 기자 cjs@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세연의 음식처방
구독
-

DBR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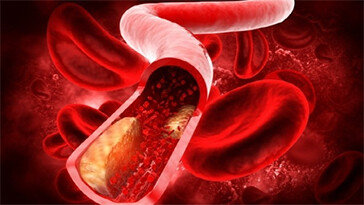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