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어에서 ‘삶을 만끽하다(Profiter de la vie)’란 말을 할 때는 ‘이득을 보다(Profiter)’란 단어를 쓴다. 삶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적 기회와 복지 혜택을 꼼꼼히 챙겨 ‘이익’까지 보라는 의미다.
프랑스에서 이익을 챙기는 한 방법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각종 지원금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녀가 2명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월 129유로(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의 가족 수당이 나온다. 개학 때가 되면 학용품 구입 보조금도 지급된다. 다자녀 가족은 세금도 감면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이민자들이 취업을 못해도 자녀만 많이 낳으면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이민정책 반대를 선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레퍼토리다.
기자도 올 여름방학 때 아이를 공립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삶의 혜택’을 실감했다. 두 달간 학교에 개설된 여가활동 센터에서 특별활동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파리의 박물관 견학, 체스와 축구교실, 수영과 음악 강습, 숲 속 산책 등 매일 색다른 체험을 하도록 해주었다. 만일 부모가 과외나 학원에 일일이 등록한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갈 만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수업료뿐 아니라 입장권, 교통요금, 피크닉 도시락과 간식까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됐다. 공교육이 무료인 것은 알았지만 한국에서 사교육 영역으로 분류되는 예체능 과외까지 공짜라니 놀라웠다.
그런데 너무 과한 것이 병이 됐을까. 1974년부터 한 번도 균형재정을 짜본 일이 없는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적자예산 감축 권고를 받고 내년 예산안에서 가족수당을 7억 유로 삭감하고 출산휴가 감축을 발표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는 능력 이상을 지출해 왔으며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복지 확대에 앞장서온 좌파 사회당 정부가 이유(離乳·젖떼기)에 나선 것은 아이러니다. 특히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었던 가족수당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70년간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사안이다. 호화로운 사생활로 유명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임기 도중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가 딸을 낳았을 때 출산·육아수당을 일반 서민과 똑같이 받아 논란이 됐다. 프랑스의 보편적 복지는 한국에서 무상 급식과 보육 논란이 일 때마다 계속 인용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수출 지향 경제인 독일과 달리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 내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또 높은 출산율은 고령층 지원을 위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버팀목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좌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에는 점점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직장맘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더 급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도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특파원 칼럼/이승헌]대통령의 취미 생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11/10/6776883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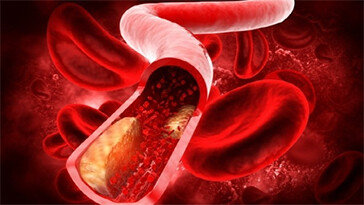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