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중국 베이징 사무실의 인터넷이 한 번 끊겼다. 한국처럼 몇 초면 영화 한 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속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그저 접속이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만리방화벽’을 좀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것이다. 10월 홍콩 시위 이후에는 안 열리는 해외 뉴스사이트가 더 늘었다.
이런 한심한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9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 대박을 터뜨렸다.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든든한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유통, 스마트 가전 운영체제(OS)로 넓혀가고 있는 알리바바의 사업 모델이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는 중국이 전통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로 굴기(굴起)의 무대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처음으로 분기별 실적에서 중국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샤오미 외에도 화웨이와 오포 등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으면 우리 시장만 내주는 격 아니냐?” 한중 정상이 10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하자 터져 나온 우려 중 하나였다. 한국의 대중(對中)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북한 현실이지만 중국의 정부와 기업은 이미 한국의 기술에 시큰둥하다. 애플처럼 창의적이지도, 세계 일등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술만 있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친 것이 기술이 좋아서였을까. 샤오미는 삼성보다 더 좋은 휴대전화를 만들었기에 중국 시장을 차지한 것인가.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제품은 1485개로 3년 만에 254개가 늘었다. 하지만 한국은 73개에서 64개로 오히려 9개 줄었다.
하루에 몇 번씩 인터넷이 끊기는 곳도 중국이고, 세계 IT 산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곳 역시 중국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보다 잘살았던 한국은 여전히 전자(前者)의 중국을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의 중국은 후자(後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다. 마오쩌둥 때는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하는 통에 중국으로 가지 못한 서구의 잉여자본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왔었다. 이제 그런 요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한 뒤 이틀 만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3억4000만 명에 이른다. 이 시장을 향해 세계의 자본이 질주했지만 승자는 중국의 토종 자본이다.
고기정 베이징 특파원 koh@donga.com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DBR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특파원 칼럼/부형권]힐러리보다 워런에 더 끌리는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11/24/68118944.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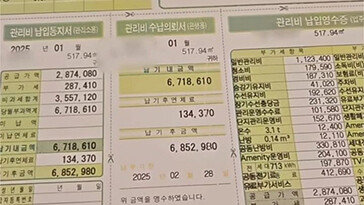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