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가 삶은 달걀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빠악!
“왜 이래?” “재밌잖아. 재밌지? 그치?”
나를 바라보는 그녀가 귀엽게 웃었다. 나의 그녀는 취향이 조금 엉뚱했다. 삶은 달걀은 꼭 내 머리를 도구 삼아 깨뜨렸고, 어두일미라며 붕어빵도 꼭 머리부터 먹었다. 그녀와 성격도 외모도 닮은 여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다. 무지하게 귀엽고 깜찍한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Am´elie·2001년)’다. 그 아멜리에가 좋아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크렘 브륄레(cr`eme br^ul´ee)였다.

사실 크렘 브륄레는 맛도 맛이지만 먹는 방법도 아주 독창적이다. 마치 달걀을 깨듯이, 살얼음 낀 개울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듯, 얇게 펴진 캐러멜을 작은 스푼으로 톡톡 깨는 게 시식 포인트. 캐러멜을 깨뜨리면 노랗고 달콤한 커스터드가 흘러나온다. 캐러멜의 씁쓸하면서도 날카로운 단맛과 커스터드의 연두부 같은 식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 사랑스러운 디저트는 입에 넣으면 온몸이 녹는 듯 달지만 나에게는 꽤 힘든 시간을 안겨줬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었으니까. 최소 단위가 50개로, 그때마다 자그마치 크림 3kg, 우유 1L, 달걀노른자 56개, 설탕 560g, 바닐라 포드 8개를 썼다. 100개씩 만든 날도 많았다. 무엇보다 커스터드가 다 익어 오븐에서 꺼낼 때가 고비였다. 180cm인 내 키보다 오븐은 높이 있었고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중탕을 위해 오븐 선반에 부어놓은 뜨거운 물이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손을 데는 것쯤이야 이골이 난 터라 어떻게든 견뎌보겠지만, 애써 만든 크렘 브륄레에 물이 들어가면 손님에게 낼 수가 없다. 현란한 영어 욕은 덤이고.
오븐 앞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는 멀리 있건만. 아니다. 내가 멀리 온 것이다. 적도를 넘어 호주 땅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건 바로 나였다.
일을 마치고 어두컴컴한 주방에 있을 때면 나는 세상의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끝났다는 의미의 끝이 아니라, 물러설 곳 없는 끝. 그 끝에서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무슨 생각해?”
동료 셰프가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쳤다. 잠깐 풀어진 정신을 추스르며 나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만든 크렘 브륄레를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된다. 주문이 오면 흑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지져서 웨이터에게 주면 끝이다. 그러고 한숨 돌리고 있노라면 주방 너머에서 여자들이 스푼으로 크렘 브륄레를 깨어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또다시 떠오른다. 한국이 답답하다며,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던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할까? 나는 그녀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필자(32)는 영국 고든 램지 요리학교 ‘탕테 마리’에서 유학하고 호주 멜버른 크라운 호텔 등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정동현 셰프
정동현 셰프의 비밀노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기자의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정동현 셰프의 비밀노트]영국 순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4/12/16/685617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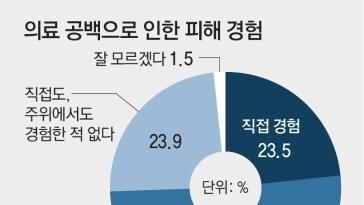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