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봉직한 대학에서 명예교수가 된 김 교수는 어린 시절의 꿈이 소설가였다. 그런데 작가가 되는 길을 묻는 소년에게 집안 어른들은 일단 신문기자가 되라고 권했다고 한다. 기자가 되면 여기저기 세상구경을 많이 하는 데다 기사를 쓰면서 글쓰기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에야 소설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는 사람들이 사준 덕분에 4쇄까지 찍었다”고 하면서 젊은 날에 일찍 소설가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요즘 즐거운 기다림이 생겼다고 말했다. 외손녀의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희망적인 것은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옆자리 직원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두고 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들이 참 이상해요. 잘사는 동네도 아닌데 학원을 대여섯 개씩 보내요.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푸념을 한다.
엄마들은 자녀의 소질을 찾기 위해 이거저거 시켜 본다고 하지만 아이의 소질은 오히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둘 때 발견하기가 쉽다. 아이들은 심심하게 놓아두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낸다.
돌이켜 보면 나는 학창시절에 어떤 놀이보다도 글 쓰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재능이어서 평생 직업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므로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다른 재주가 없었으므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없기 때문이었다.
윤세영 수필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꽃을 기다리듯](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4/02/7048188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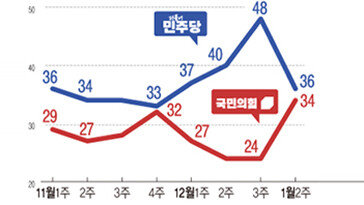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