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오베라는 남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남자들에게는 자기가 어떤 남자가 되고 싶은지를 선택할 때가 온다.’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따른다. 결과에 대한 책임과 포기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그걸 극복할 때 비로소 남자(또는 어른)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도자의 선택은 ‘책임과 미련’의 차원을 넘어선다.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선택은 괴로움을 넘어 두려움이어야 한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스산한 겨울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집에 들어섰다. 안주에는 손을 대지 않고 백세주 3병을 들이켰다.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나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이 남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2년 대선을 1주일쯤 남겨둔 시점이었다고 한다. 이 한정식집 여종업원에게서 전해 들은 얘기다.
그에게 투영된 사회적 갈망은 변화였다. 늘 비주류로 살아온 노무현의 ‘변방정신’이 공존과 공생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책 ‘담론’에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늘 변방에서 이뤄진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의 공간이 못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변화의 동력을 모으기보다 중심부와의 전쟁에 몰두했다. 그의 실패 이유도 ‘담론’ 속에 있다. “변방이 창조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적 공간이 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 이념전쟁은 ‘중심부의 가치 지키기’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 산업화의 성과는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증언하는 가치다. 그럼에도 변방이 집요하게 ‘역사 흔들기’에 나서자 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란 전면전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이 전쟁의 당위성을 떨어뜨린다. 변방은 더욱 집요하게 친일과 독재의 그림자를 되살릴 것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말처럼 사회적 좌편향이 장기 독재에 따른 반작용의 결과임을 먼저 고백했다면 전세(戰勢)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0·28 재·보궐선거 결과 야당이 참패했다. 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투표율은 20.1%로 헌정 사상 최저였다. 주요 선거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의 전쟁, 박근혜의 전쟁’에 넌더리가 난 민초들이 변화에 대한 갈망마저 접은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논어에는 ‘효당갈력 충즉진명(孝當竭力 忠則盡命)’이란 말이 있다. 힘을 다해 효도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는 얘기다. 힘을 다함보다 목숨을 바침이 더 비장하다. 효도보다 충성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국가 경제의 비상벨이 곳곳에서 울리는 상황에서 충성은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산업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현 시점에서 지도자가 목숨을 바쳐야 할 일이 또 있는가. 그것을 위해 ‘변방의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군사정변을 일으킨 것 아닌가.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면하자니 저질스러움이 기다리고, 참여하자니 선택할 곳이 없는 지금 정치권이 바로 ‘헬조선(지옥 대한민국)’의 주범인지 모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달콤쌉싸래한 정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정세연의 음식처방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재명 기자의 달콤쌉싸래한 정치]승부사 YS, 승부사 박근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1/23/7495385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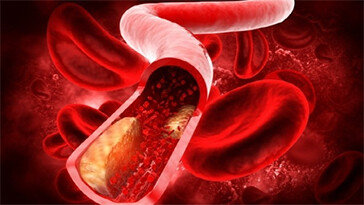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