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경기장은 미로 같았다. 길을 헤매다 1층 후미진 엘리베이터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었다. 찬조 연설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며 재를 뿌리고 나오는 길이어선지 표정은 굳어 있었다. 조롱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웠을까. 그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섰다. 닫힘 버튼이 닿았다면 모른 척 누를 터였다.
그날 낮 크루즈가 야외무대에 섰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용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연설이 끊겼고, 크루즈의 표정도 일그러졌다. 조연의 운명은 그런 거였다.
“내 아내를 욕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크루즈는 그렇게 지지자의 표심을 걷어갔다.
토너먼트 방식인 미국 대선은 선택의 연속이다. 결정이 내려지면 변수가 상수가 되고, 관심은 떠나간다. 크루즈 지지자와 샌더스 지지자에게 두 후보가 공들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2주간의 전당대회 현장 취재에서 확인한 건 ‘앙금’이었다. 11월 8일 본선까지 100일의 시간이 있지만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패자가 승복하지 않는 건 승자 지지가 불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클린턴은 여전히 의혹 덩어리였고,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폭군이었다.
트럼프는 당 지도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딸 이방카를 들러리로 세우고 원맨쇼를 해야 했다. 코앞에서 본 이방카는 여신이었다. 트럼프 가족이 ‘우성 유전자’를 과시한 무대라는 평도 있지만 클린턴-오바마-샌더스 삼각편대에는 힘이 부쳤다.
두 후보가 치고받는 과정에 거짓말도 난무했다. 정치인 발언의 진실 여부를 검증해 퓰리처상까지 받은 폴리티팩트(politifact.com)에는 후보들의 거짓말들이 열거돼 있다. ‘미국인은 거짓말쟁이를, 일본인은 예의 없는 사람을, 한국인은 의리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거짓말이 들통 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데 이번엔 ‘삼류들의 전쟁’이어선지 기대 수준이 낮은 모양이다. 우리도 ‘깜’이 없다지만 미국도 어지간한 거다.
주변에선 말한다. TV로 본 전당대회가 대단한 축제였다고. 쟁쟁한 정치인들과 유명 배우, 가수들이 등장했으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잔칫상 뒤에서 가족끼리 드잡이하는 잔상이 남아서인지 밥 얻어먹고 소화 안 되는 기분이었다. 1년 뒤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법한 찜찜한 축제였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 sunshade@donga.com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패션 NOW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특파원 칼럼/장원재]‘캡사이신’은 답이 아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8/08/7961432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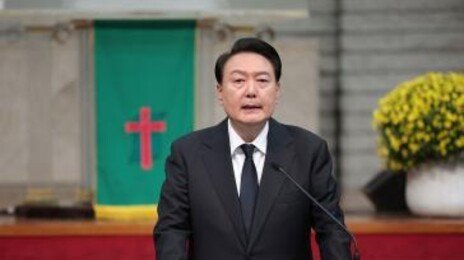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