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임시로 거처를 정했던 곳은 충남 홍성에 있는 한 농가에 딸린 4평 남짓한 컨테이너 원룸형 숙소였다. 지대가 높아서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일몰이 환상적이었다. 9월부터 생활했으니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평화로운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우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았다. 귀농인의 집은 보증금 없이 월 15만 원 정도였고, 식사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파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에서 장을 봐 직접 해먹었다. 가끔 주인아저씨께서 농산물을 조금씩 나눠 주시기도 했다. 도시에서는 매달 200만 원씩 나오던 카드 비용이 나오지 않으니 마음의 부담이 적었다.
물이 얼어버린 귀농인 임시공간에서 살아남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주인아저씨의 도움으로 혹한기 상수도 녹이는 열선을 이용해서 상하수도를 녹여 사용할 수 있었고, 전기로만 식사와 난방을 해결했더니 전기료가 30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해 겨울, 시골 생활의 첫 번째 교훈을 얻었다.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있는 것이고, 관리비를 내지 않는 대신 모든 집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 준비가 부족한 첫해 겨울은 정말 난민이 따로 없었다. 나도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귀촌했다.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다. 그러나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달랐다.
―서혜림
굿바이 서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142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굿바이 서울!/이한일]58년 개띠 젊은 이장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7/07/8524086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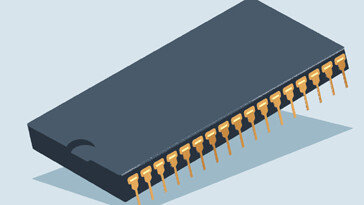


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2017-06-24 20:42:10
행복만이 최선인가,, 행복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불행을 겪으면서 알게 되고 삶의 깊이가 깊어진다, 행복만 가득하면 인생은 나태해진다,, 나만의 행복을 버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역사는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2017-06-24 22:24:26
원래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거든,,헛꿈들 꾸지마라..내가아는 귀농인들 중 시골 경험 없던 사람들 고생 찔찔히 하다가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가정마저 순탄치 않더라.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면 어느정도 기억을 일깨워 정착이 가능할 런지는 모르겠다만.. 99.9% 실패 하더라.
2017-06-24 22:38:17
보증금 없는 월 15만원 컨테이너... 멍청한 동아야 이걸 일반적인 귀농 일기라고 기사화하는거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