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공론조사 만능 아니라는 신고리 공론화위원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0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평소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역설해온 문 대통령으로선 앞으로도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론조사가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熟議)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김 전 대법관의 고언(苦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공론조사를 둘러싸고 진영논리에 따른 여론전쟁이나 가짜 뉴스가 판칠 경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여주엽의 운동처방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2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3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4
李-장동혁, 말 없이 악수만…張 “대통령 기념사 박수 칠 수 없었다”
-
5
“개발만 5년” 삼성 S26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특허로 진입장벽까지
-
6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7
“미국의 힘이 곧 평화” 트럼프 5년, 해외 美 군사개입 10번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53세 김석훈 “체력 예전과 달라”…노화만의 문제 아니었다 [노화설계]
-
10
박사과정 밟는 LG ‘신바람 야구’ 주역 서용빈 “공부하는 지금, 인생 전성기” [이헌재의 인생홈런]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7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8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2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3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4
李-장동혁, 말 없이 악수만…張 “대통령 기념사 박수 칠 수 없었다”
-
5
“개발만 5년” 삼성 S26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특허로 진입장벽까지
-
6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7
“미국의 힘이 곧 평화” 트럼프 5년, 해외 美 군사개입 10번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53세 김석훈 “체력 예전과 달라”…노화만의 문제 아니었다 [노화설계]
-
10
박사과정 밟는 LG ‘신바람 야구’ 주역 서용빈 “공부하는 지금, 인생 전성기” [이헌재의 인생홈런]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7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8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7/133440259.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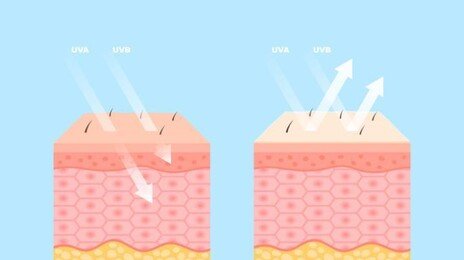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