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년간 제작된 수백 편 드라마 가운데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흥행에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른바 의학 드라마 불패 신화다. 의학 드라마의 이정표를 세운 ‘하얀 거탑’ 이후 자폐 의사의 성장담을 다룬 ‘굿 닥터’는 미국에 시나리오까지 수출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그레이 아나토미’ ‘하우스’ 같은 드라마는 팬덤을 이끌고 있다. 의학 드라마가 흥행 보증수표인 이유는 병원이라는 장소가 갖는 극적인 요소 때문이다.
▷잘생긴 남녀 주인공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며 고뇌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흡인력 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의대에 가고 수련 과정까지 간 많은 전공의(레지던트)들이 환자 앞에서 교수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다. 3월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들이 교수의 폭력을 못 견디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해당 교수는 주먹을 비롯해 야구공 수술도구 인체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을 때렸다. 폭행 장소도 수술실에 국한되지 않고 회식 장소나 길거리로 이어졌다.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환자가 안 좋아져도 전공의 탓이고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폭행이 가해졌다. 너무 다수에게 자행된 일이라 (폭행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고막이 터져도, 피멍이 들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수가 논문심사 등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횡설수설/이진영]이제야 개인 폰 바꾼 대통령 부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5/13050103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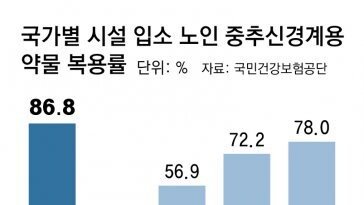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