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는 박근혜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꾀한 적이 있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자 “그러면 빚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빚을 매개로 한다는 게 달랐을 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기본 취지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았다.
그 밑그림을 그린 것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일 때 기준금리가 오르는 걸 보고 있자니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지난 정부의 많은 경제 실정(失政)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이고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
2014년 7월 취임한 그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모조리 풀고, 통화정책 결정권이 있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겐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파했다. 당시는 미국이 오랜 완화 기조를 서서히 접고 본격적인 긴축을 준비하던 때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도에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국제적 흐름과도 반대되는 길을 택했다.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목표로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연평균 6∼7% 수준에 불과하던 가계빚 증가율은 이내 10% 이상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그의 생각대로 흐르지 않았다.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린 경기는 회복세에 한계가 있었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연 2∼3% 수준에서 정체됐다. 반면 이미 고삐가 풀려버린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에 이상 신호를 주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넘치는 와중에 대출 규제마저 풀리면서 ‘불황 속 투기’가 만연했고, 막대한 상환 부담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고착됐다. 가계빚의 증가가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침체된 내수를 더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금리나 재정을 동원한 단기 부양책들은 집행하기도 쉽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오지만 그만큼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
물론 그의 선택이 극한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강력한 부양책을 추진한 덕에 고된 저성장의 보릿고개를 비교적 순탄히 넘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그의 ‘지도에 없는 길’ 항해에 이끌려 나갔다가 최악의 가계부채와 이자율 상승이 빚어낸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통스러운 긴축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우린 벌써 한 해 수조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더 치르게 됐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서민 가계의 고통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한때 정권 최고의 실세였던 그도 이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죽은 권력’이 됐다. 그래도 자신이 소신 있게 밀어붙였던 정책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은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그가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하다.
데스크 진단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데스크 진단]알고리즘은 공정할 수 있는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12/10/8766776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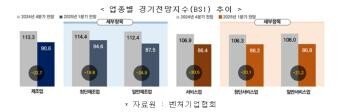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