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시인의 산문집을 읽다가 위의 구절과 마주치자 정신없이 달리던 마음이 빨간 신호등 앞에 선 것처럼 멈칫 했다. 입에서 태어났다가 귀에서 죽는 말, 죽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은 말, 아니, 살아남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시처럼 아프게 박혀 있는 말이 몇 개 떠올라서였다.
대학 시절,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들었던 말도 떠오른다. 그날은 그동안 살던 자취방에서 이사 가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눈은 펄펄 내리는데 이사를 도와주겠다던 남자 동기 셋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나마 전화를 받은 동기의 설명이 가관이었다. “아침에 나가려는데 우리 할머니가 추운데 어딜 가냐고 물으시잖아. 시골에서 올라온 과 동기 이사를 도와주러 간다고 했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해서, 전라도라고 하니, 전라도 아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못 나가게 하신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전라도 아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라는 할머니 말에 방점을 찍은 변명이라니. 이것은 말이냐, 막걸리냐.
나를 아프게 한 말은 편견에 찬 말, 차별하는 말, 배제하는 말, 재단하는 말, 심판관의 말이었다. 아무도 쥐여주지 않은 칼을 휘두르는 이런 말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고 방부제보다 그 독기가 오래 간다. 연못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뾰족하게 박혀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라.
물론 살면서 그런 비수 같은 말보다는 나를 살린 말을 더 많이 들었다. “넌 이대로도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그래,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시간도 지나가게 마련이야” 같은 말에 의지해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은 아픈 내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만이 힘든 건 아니라는 위로와 연대감을 주며, 다시 한번 세상은 선의에 차 있다고 믿게 해줬다.
박산호 번역가
내가 만난 명문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월요 초대석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내가 만난 名문장/나희덕]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12/16/8775563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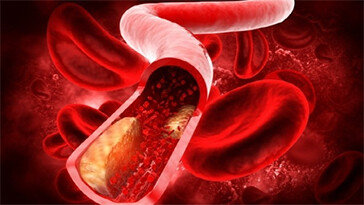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