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깎다’

며칠 전 어떤 프로그램의 퀴즈로 우리말 표기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다.
① 깎아 ② 깍아
맞춤법의 본질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 쉬운 문제를 풀어보자. ‘꽃’은 왜 ‘꽃’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말의 맞춤법은 우리의 발음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었다. 별도의 맞춤법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표기한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는 [꽃]이라 발음하지 못한다. [U]으로만 발음할 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는가?
단어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뒤에 어떤 것이 오는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는 것은 뒤에 오는 소리 때문이다.
꽃+ㅣ -> [꼬치]: 연음규칙
만 -> [꼰만]: 자음동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도 -> [V또]: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가 ‘꽃’이라고 적는 이유는 ‘꽃’이라고 표기해야 [꼬치, 꼰만, U또/꼬또]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규칙들이 적용돼 우리의 일상 발음이 되는 원래의 것을 거꾸로 찾아내면 ‘꽃’이라는 의미다.
우리들 모두 머릿속에는 사전이 있다. 그 사전 안에는 원래의 모양인 /꽃/이 저장돼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 규칙들이 적용돼 [꼬치]나 [꼰만], [U또/꼬또]로 소리 나는 것이다. ‘꽃’이라는 표기는 우리 머릿속에 저장돼 있으리라 여겨지는 그 원래의 모양이다. 우리의 다양한 발음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적은 표기인 것이다.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까까]라는 발음에서 뒤 음절의 ‘ㄲ’을 보고 ‘깎아’로 적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하지만 ‘깎고, 깎는, 깎아, 깎도록, 깎으면’의 발음 원리 역시 ‘깎다’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실제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
김남미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
맞춤법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맞춤법의 재발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1/17/8820099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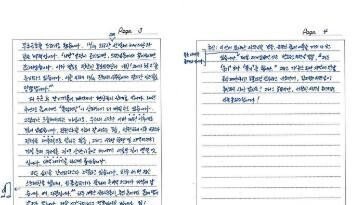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