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작(獨酌) ―임강빈(1930∼2016)
주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좀 한다고 겸손을 떨었다
세상 한구석에서
대개는 외로워서 마셨다
그 자리가 허전하다
거나하게
정색을 하며 마신다
독작 맛이 제일이라 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혼자 마신다
과거는 배반을 모른다. 지나온 삶의 흔적은 사람의 어딘가에 묻어 있다. 얼굴, 눈빛, 하다못해 몸짓 같은 데서도 티가 난다. 특히 오래 살아온 사람한테는 과거의 흔적이 체취처럼 풍겨난다.
그렇다면 시라는 업을 굉장히 오래,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해온 사람에게서는 무슨 느낌이 풍길까. 이 질문 앞에서 임강빈 시인을 떠올린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시인이었다. 누가 시켜서, 무슨 딴 목적이 있어서 시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시 한 편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진짜 시인이었다.
시인은 백 편의 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 사람에게 읽히는 한 편의 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시를 남기지 못해서 어찌 하나 한탄했다. 그렇지만 시인의 곁에는 따르는 이도, 존경하는 이도 많았다. 임 시인은 늘 겸손에 살았지만 왜 백 사람에게 읽히는 시가 없었을까. 그의 시 ‘독작’만 봐도 백 사람, 천 사람이 읽고 품을 만하다. 높이 올라갔으나 스스로를 낮추었던 한 시인을 회상하며 이 시를 읽는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37>산수유나무의 농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4/07/8950045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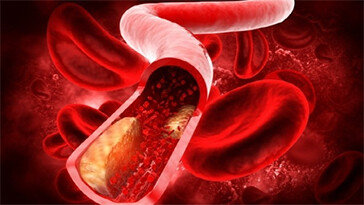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