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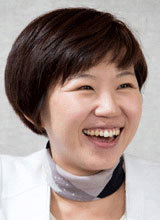
전공과 직업은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30, 40대들의 이야기라고 감히 넘겨짚어 본다. 시골행을 택한 데는 시쳇말로 ‘깊은 빡침’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지 못했다는 ‘빡침’이다. 시골이건 외국이건 눈감고 지도를 아무데나 짚어서라도 내 선택으로 어딘가 가고 싶었던 것 같다.
영어강의를 집어던진 이유도 비슷하다. 유치부부터 대기업 임원강의까지 해봤고, 토익, 텝스, 입시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학원에서도 해보고, 직접 학원을 세워서도 해보고, 인강도 해보고 심지어는 팟캐스트까지 나름 순위권에 들도록 강의해봤다. 하지만 먹고살기 위한 일은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보고 싶었다.
일단 1년의 치열한 정보 수집기간을 가졌다. 도서관에서 ‘귀농’, ‘귀촌’ 두 키워드에 걸리는 책은 모두 읽었다. 웹상에서 귀농귀촌 핫플레이스를 발견하면 주말에 조용히 다녀왔다. 그리고 귀농귀촌 캠프에 참석해본 후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 1.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일 것 2. 유기농을 하는 지역일 것 3. 젊은 사람이 많을 것. 혹시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두 시간이면 서울에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주었다. 기왕 시골에 사니 먹거리만큼은 유기농을 먹을 수 있어 좋고, 젊은 농부가 많은 지역이라 마실 나갈 때 술친구가 있어서 좋았다.
최근 시골을 찾는 이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어차피 도시에서 원하는 일로 성공할 수 없다면, 마음에 드는 예쁜 시골에서 살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다. 어렵게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은 기존세대의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다. 먼저 시골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청년 농업정책들도 환영한다. 좁은 국토를 더 좁게 쓰는 도시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고 널찍한 시골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행복한 젊은이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서혜림 청년 미디어협동조합 로컬스토리 운영
굿바이 서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굿바이 서울!/서혜림]소도시 비즈니스가 뜬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7/20/9113757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