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의 논란 장면
1999년 6월 테니스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전.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당시 19세)와 ‘여제’ 슈테피 그라프(독일·당시 30세)가 맞붙었다. 힝기스는 중반까지 경기를 주도했다. 1세트를 얻었고 2세트에서도 그라프의 서비스 게임을 따내 2-0으로 앞섰다. 자신의 서비스 게임만 지켜도 왕관을 쓸 수 있었다.
문제의 2세트 3번째 게임. 그라프의 공을 힝기스가 넘겼다. 그라프는 되받지 못했다. 육안으로는 공이 그라프 코트 끝에 살짝 걸친 듯했지만 판정은 아웃. 힝기스는 격렬히 항의했지만 심판진은 완고했다. 항의 도중 그라프 코트로 건너가 해당 공의 자국을 확인하는 반칙을 범해 벌점 1포인트만 더 잃었다.

경기 흐름이 확 바뀌었다. ‘멘붕’에 빠진 힝기스는 결국 졌다. 눈물범벅으로 시상대에 올라 “꼭 이 대회에서 우승하겠다. 그땐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 코카인 복용, 잦은 은퇴 번복, 이혼까지 겹친 그는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우승하지 못했다. 10대 때 무려 5개 메이저를 석권하며 또 다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그라프, 세리나 윌리엄스가 될 수도 있었던 천재 소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힝기스의 몰락이 그 판정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공의 궤적을 좇는 전자 판정 시스템 ‘호크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단순히 한 선수의 억울함 해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인 메이저 결승전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최대 가치는 누가 뭐래도 공정함이다. ‘육체’와 ‘땀’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에 들어온 디지털이지만 인간의 오류를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정민 디지털뉴스팀 차장 dew@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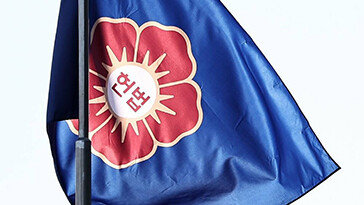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