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해오름예술촌장이다. 남해군의 ‘독일마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던 중 폐교를 발견하고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 예술의 피가 돌게 하는 데에 생의 마지막을 쏟겠다는 다짐을 했다. 2년을 몰두하여 ‘해오름예술촌’을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구태여 토를 달지 않아도, 억지로 도(道)를 갖추지 않아도 차나 한 잔 마시면 될 것이라는 촌장의 말에 끌려 예술촌을 자주 찾았다. 그럴 때마다 촌장은 커피를 내려줬다. 어느 날 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왠지 모를 낯익음의 이유를 깨달았다. 고교 시절 내 은사였던 것이다. 그렇게 20여 년 전의 인연이 우연을 가장하여 불현듯 찾아왔다.
고교 시절 선생님은 시골여행을 다니다가 버려진 궤짝, 농기구 등 민속품을 코란도 뒷좌석에 싣고 오는 게 취미라고 했다. 그저 기이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 모은 민속품이 해오름예술촌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로서도 진열된 민속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희귀성과 지역성이 뚜렷한 민속품으로 가득한 전시실은 웬만한 박물관보다 나았다.
한번은 차 트렁크를 열어서 삽과 향을 보여주었다. 집과 예술촌을 오가다 보면 길가에 로드킬당한 고양이 사체를 종종 보는데 항상 묻어주고 향 하나를 피워 준단다. “나는 훗날 저승에 가도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묻어준 수많은 고양이들이 촌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마중 나올 거니까”라며 웃는다.
장인과 장모께도 사람 내음 진하게 나는 예술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간 적이 있다. 촌장의 매력에 반한 장인은 촌장처럼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사람 내음에 반한 건지 단지 수염에 반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 다시 해오름예술촌을 찾았으나 사람 내음이 나지 않았다. 교사, 도예인, 사진작가, 장승꾼, 서예가, 천연염색가, 촌장으로 살다가 바람처럼 저세상으로 떠나가고 없었다.
남해를 매년 한두 번씩 방문하지만 촌장 없는 예술촌은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올해는 예술촌을 찾아서 “하늘만큼 좋은 세상.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고 촌장이 쓴 팻말 앞에서 그가 남겨둔 내음을 맡고 올 생각이다. 길게 기른 장인의 흰 수염을 보며, 고양이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을 촌장의 모습을 그려본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9〉양식장 폐허, 박물관으로 부활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8/17/9154802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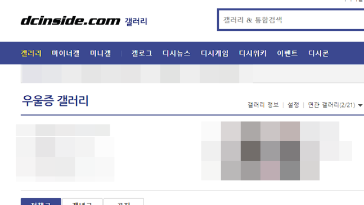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