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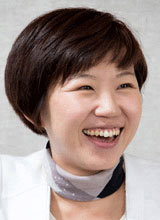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귀촌 생활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살든 생활은 반복적인 행동이라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글을 써낸다는 일은 부담이었다. ‘도시에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시골의 삶 또한 워낙 다양하다. 도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뿐인데, 나는 농사가 아닌 미디어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었지만, 소도시에서 창업을 해 일하는 청년이 많지는 않으니 최대한 ‘소도시 비즈니스의 현장’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도시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며 공동체와 지역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깨끗한 도로는 당연하고, 교통이 편하거나 부모님의 직장 사정에 따라 이사를 했을 뿐 내가 사는 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따라 귀촌을 하며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있다면 지역에 대한 고민이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일들을 눈앞에서 직접 삶으로 지켜보는 현장감이 주는 감정이다. 정말로 학교가 사라져가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가뭄이 심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때도 있었다. 지역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 겪기도 듣기도 했다. 옆집 할머니가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기록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역사에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이제 굿바이 서울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몇 번이고 그만 쓰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재를 마무리해 달라는 통보를 들으니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다. 지난주에 시골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옷감에 출력해서 만든 ‘촌(村)을 입다’ 논두렁 패션쇼를 진행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려던 차였다. 여전히 시골의 삶은 여러 색으로 변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연재는 마감하지만 이곳에서 더 다채로운 삶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찾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혜림 청년 미디어협동조합 로컬스토리 운영
굿바이 서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굿바이 서울!/서혜림]굿바이, 굿바이 서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9/21/9211105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