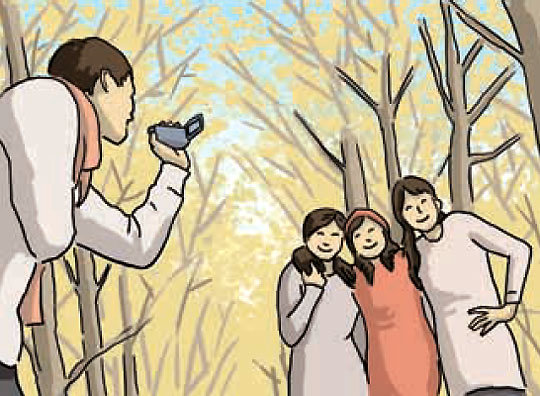

한 번이라도 영상을 찍고, 편집해 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그냥 흘려보냈을 시간들이, 찍음으로써 얼마나 특별해지는지. 찍은 화면들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 속에 놓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미웠지만, 이상하게 카메라를 통해 보면 스르르 마음이 녹으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도 그때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도 벌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이루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올해 가장 많이 찍은 건 스케치 영상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부탁했다. ‘우리 행사가, 단체가, 회사가 이렇게 멋진 곳이란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스케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마도 ‘있어 보이는 그림’일 것이다.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었던 나는 ‘있어 보이는 그림 찾기’에 열중했다. 그렇게 내 카메라가 향한 곳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 생각은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된다. 매력적인 사람, 호감적인 사람, 멋진 사람을 좋아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촬영할 때마다 느낀다. 세상엔 안 그런 이들이 훨씬 많은데, 내 세상에서 그런 이들은 점점 줄어든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헤아리려는 노력, 하지 않았다.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다.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일에 담기고, 일할 때 습득한 태도가 일상에 밴다. 나의 카메라가 외면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소외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들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 나는 어떤 직업인이 될 수 있을까. 사랑받아 마땅한 것들을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싶다. 주기적인 직업 윤리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정성은 콘텐츠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2030 세상/오성윤]제임스 본드가 늙고 약해질 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10/24/9255628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