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었을 때 개학 전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은 교실 열쇠였다.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시간마다 직접 교실 문을 열고 잠가야 한다. 어느 날, 깜박 잊고 열쇠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동료 교사에게 열쇠를 빌리러 왔다 갔다 하느라 무척 번거로웠다. 미안하고 부끄러웠는데 동료들은 자신들도 그런 적이 많다며 한국의 교사들은 열쇠에 신경 안 써도 돼서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프랑스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이동식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교사가 문을 열기 전에는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 루앙의 고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하던 날이었다. 학생들이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고 “봉주르, 마담(Bonjour, Madame)” 하고 인사를 했다. 문을 열었는데도 학생들이 그대로 서 있길래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차례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와서도 앉지 않고 자리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순간 좀 당황스러웠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서 기다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다소곳이 서서 교사를 기다리는 프랑스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던 우리의 옛날 학교 분위기가 생각났다. 학창 시절에는 그런 풍경이 강압적인 일제 문화의 잔재라 생각해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이기 때문인지, 프랑스 학교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어서인지, 반듯하게 서서 나를 기다리는 프랑스 학생들을 보니 흐뭇했다. 우리는 반장 외에는 앉아서 선생님을 맞이했으니, 모두 서서 기다리는 프랑스 학생들이 더 깍듯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교실 문화를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교실 예절로 여기고 있다.
어느 날, 복도에서도 학생들이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려 공손하게 나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들이 감탄을 하며 뜬금없이 ‘한국 교육 예찬’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프랑스 학생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느니 한탄을 하다가, 나를 향해 “한국은 훨씬 낫지?” 하고 물었다. 나라만 바꾸면 “프랑스는 훨씬 낫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주 듣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아니라고 대답하며 같이 성토를 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임정원 하비에르국제학교 한국어·프랑스어 교사
임정원 하비에르국제학교 한국어·프랑스어 교사
임정원의 봉주르 에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임정원의 봉주르 에콜]〈16〉‘차렷, 경례’를 대신한 인사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3/08/9444272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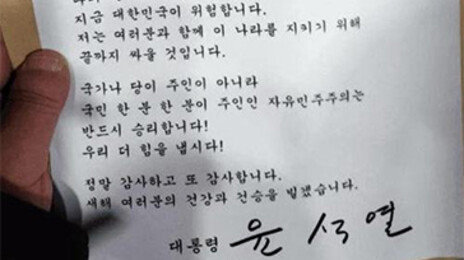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