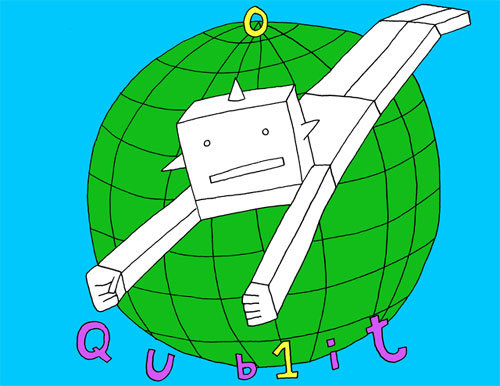

평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 이상이 됐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는 그물처럼 펼쳐진 깊고 넓은 양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양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물리적 단위를 나타낸다. 모든 물리량을 쪼개고 쪼개면 양자라는 작은 단위가 된다.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데, 이 양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양자의 발견으로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와 물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고 반도체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었다. 최초로 양자를 발견한 사람은 독일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였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도 훌쩍 넘어 거슬러 올라가는 1900년의 일이다.
내가 대학 1학년이었던 1980년, 원자핵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발견됐다.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한 세계에서 나노의 세계로 세상이 전환됐다. 양자의 세계는 나노의 세계다. 양자역학과 나노의 세계가 융합되면서 세상의 진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리가 한순간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휴대전화가 만들어지고, 달과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신망이 완성됐으며, 반도체 집적회로를 이용해 초당 20조 이상의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가 개발됐다. 이 모든 것은 양자역학의 효과였다.
올해 초 IBM이 가로세로 크기 2.7m에 냉각시스템까지 갖춰진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했다. 0과 1의 비트 신호로 작동되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큐비트(0과 1의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둘이 섞여 있는 ‘중첩’ 상태)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이내에 풀 수 있다.
양자역학에서 다루던 기본 개념이 이제는 양자컴퓨터로 실현됐다. 양자컴퓨터가 일반화된다면 이세돌 바둑 프로기사와 대결했던 알파고보다 더 빠르고 정교해진 인공지능을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양자역학의 시대는 지금부터다.
아이돌그룹 2NE1 출신 가수 씨엘의 아버지로 ‘딴짓의 행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기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