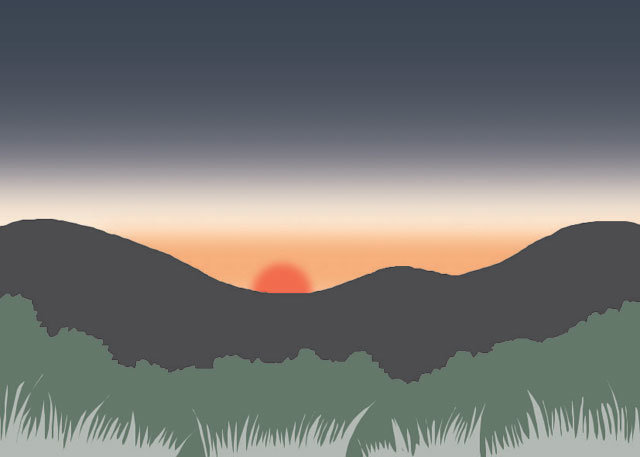
그리운 그 사람 ― 김용택(1948∼ )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모낸 논 가득 개구리들 울어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젠가, 아 언젠가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중략)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때를 해질 녘이라고 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는 유독 이때를 그린 작품이 많다. 그저 풍경일 뿐인데 해질 녘을 따라잡는 고흐의 시선은 슬프고 서럽기까지 하다. 고흐가 서러운 것인지 해질 녘이 서러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시간의 정취가 특별한 것은 확실하다. 집에 가려고 새들도 날아오르고 들판에 매어 놓은 염소와 소도 울어댄다. 사람도 동물의 하나라서,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해질 녘을 알아본다. 돌아갈 곳 없고, 돌아갈 일 없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동요를 일으킨다. 어서 집에 가자. 따뜻한 집으로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자. 해질 녘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김용택 시인의 작품도 이 시간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돌아와야 할 시간이고, 돌아와야 할 사람인데 오지를 않는다. 오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산도 돌아앉아 울고 있다.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고, 영영 못 올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을 일러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부른다. 시인은 진한 그리움을 저렇게 뜨겁게 그려 놓았다. 시인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으니. 게다가 이 땅의 5월이다. 그리움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97〉그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6/01/95796165.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