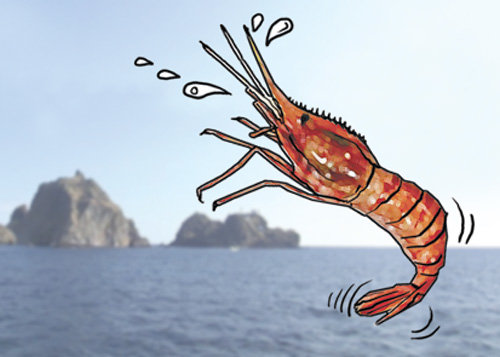

내가 독도새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몇 해 전의 현장 조사 경험 덕분이다. 하루는 독도새우잡이 어선에 이튿날 새벽 동승하기로 선장과 약속했으나 샛바람이 예상돼 취소되고 말았다. 허탈해진 조사원들은 초저녁부터 해변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늦은 밤, 해변을 지나던 선장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날씨가 조업할 정도는 될 것 같으니 배 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른 새벽, 늦도록 술을 마신 조사원들은 어선에서 뱃멀미를 피할 수 없었다. 10시간 이상을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와 촬영을 했다. 오로지 빨리 입항하기만을 기다리며. 입항하자마자 선장은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지친 조사원들을 위해 시원한 콩국수를 내왔다. 동료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워 입에 대지 않았다. 뒤이어 독도새우가 쟁반 위에 소복이 담겨 나왔다. 속은 불편했지만 한입 먹어봤다. 그 이후부터는 껍질 까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선장은 나를 보며 “속이 불편해도 독도새우는 잘 들어가죠”라며 웃었다. 정말 그랬다. 뱃멀미를 잊게 하는 맛. 머리에 닭 볏처럼 생긴 가시가 있는 닭새우는 쫄깃하고 단맛이 나서 랍스터와 유사했다. 꽃새우는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고, 도화새우는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했다. 이런 독도새우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후 선장이 새우 잡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구입해 회식을 하곤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화새우 알을 부화시켜 일정기간 사육하는 데에 성공하여 12만 마리를 울릉도 연안에 방류했다. 올해는 대량으로 생산하여 처음으로 독도 해역에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한다. 1.5∼2.5cm의 어린 새우들은 4∼5년 뒤 20cm 이상으로 자라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앞서 2013년부터는 꽃새우는 매년 5만∼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본궤도에 오른 독도새우 방류사업이 성공하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서민들의 밥상에도 독도새우가 오르는 날이 오기를. 그런 날이 오면 정상회담 공식 만찬 메뉴에 독도새우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웃나라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여행의 기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60여년 만에 최고 된 韓 원양어선[김창일의 갯마을 탐구]〈31〉](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8/09/96894625.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