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하기에 전방위 총동원령
조국 불 끄려다 민심 놓칠 것

정연욱 논설위원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이해찬이 부적절한 ‘3·1절 골프’ 파문으로 낙마했다. 야당의 파상 공세도 있었지만 결정적 원인은 당청 간 파워게임에서 밀린 탓이 컸다. 청와대는 총리 교체를 수긍하면서도 그 시기를 두 달 뒤 5·31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고 했다. 하지만 정동영이 당권을 쥔 열린우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코앞의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게 파워게임의 속성일까. 후임 총리 인선을 놓고 당청 갈등의 2라운드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 주변에서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총리 인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까지 흘러나오자 청와대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부글부글했다. 하지만 총리도 막판에 여당에서 민 한명숙으로 급선회했다.
청와대의 연전연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26 서울 성북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은 정동영에게 출마를 제의했으나, 정동영은 끝내 거부했다. 한 몸이어야 할 당청은 친노와 비노의 대결 구도로 확연히 갈라섰다. 그 여파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도 태어난 지 4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여권의 눈에도 조국 사태는 악성이다. 쏟아지는 조국 일가의 각종 의혹을 보면 자신들이 선점했다고 생각한 ‘반(反)특권·공정·정의’의 가치가 한 편의 쇼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었기에 후폭풍은 더 컸다.
이 정도면 여당에서도 ‘조국 반대’ 민심에 맞서 조국 카드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지만 ‘조국 구하기’ 일색이다. 그나마 박용진, 금태섭 의원 정도가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소신 발언을 했지만 이들은 당내에서 ‘친문’이 아니다. 여권 수뇌부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정무수석이 아예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을 질타하는 초유의 상황은 친문 지지자들에게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묵시적 요구’에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여권의 차기 주자들도 조국 구하기에 뛰어들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일단 피해라.” 여권은 이 심경으로 조국 사태도 결국 시간문제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 조국 청문회는 여야 정쟁으로 흘러가고, 대통령이 던진 교육제도 개선으로 새 이슈를 내세우면 조국 사태도 묻혀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단순히 여권의 분열 탓으로만 볼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두 달 뒤 정권 시계가 반환점을 돌면 권력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게 된다. 조국 수사에 나선 검찰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민심을 거스른 조국 구하기는 정권의 명운을 걸 사안이 아니다. 새판을 짜야 한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월요 초대석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신광영]복종 대신 승복 끌어내는 잘 쓴 판결문의 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4/11/131400663.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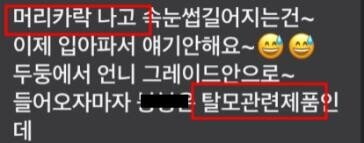


댓글 60
추천 많은 댓글
2019-09-03 07:19:08
문재인 OUT!! 조국 OUT!!
2019-09-03 07:19:15
궤변 기변 합리화 모르쇠 몰랐다 너탓이다 난 모른다 편가르고 줄긋고 죽창선동가는 그런자리 수행못한다 법률적 이사이면서 바빠서 참석도 업무파악도 못했다 그럼 그자리 왜하냐 깔끔하게 물러나라
2019-09-03 07:56:10
이게 나라가 마습니까 ? 범법투성이 오물투성이를 법무부장관에 올리기 위해 여권의 이미 노조에서 갈고 닦은 억측 밀어붙이기에 익숙한 원내대표와 친문세력들의 마구잡이식 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에 구역질이 나고 조국의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