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저 아이들이 좋다 ― 이성복(1952∼)
나는 저 아이들이 좋다. 조금만 실수해도 얼굴에 나타나는 아이, “아 미치겠네” 중얼거리는 아이, 별것 아닌 일에 ‘애들이 나 보면 가만 안 두겠지?’ 걱정하는 아이, 좀처럼 웃지 않는 아이, 좀처럼 안 웃어도 피곤한 기색이면 내 옆에 와 앉아도 주는 아이, 좀처럼 기 안 죽고 주눅 안 드는 아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박아 버려도 제 할 일 칼같이 하는 아이, 조금은 썰렁하고 조금은 삐딱하고 조금은 힘든, 힘든 그런 아이들. 아,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 품에 안겨들면 나는 휘청이며 너울거리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기어 다닐 때, 이성복은 시인이 됐다. 내가 세상천지 구분 못 할 때 그는 이미 세상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세대 전의 일이었다. 문학사에서 이성복 시인은 ‘병든 세계’와 ‘아픈 시대’를 특징적으로 그려낸 시인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1970, 80년대 사건들을 읽을 뿐이다. 오히려 시대의 진실은 이 같은 시인들을 통해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배움이 그것으로 그쳤다면 좋았을 것이다. 과거에 아픈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잠시 생각만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인의 시를 읽으면 자꾸 생각하게 된다. 그가 그려낸 ‘병든 세계’는 아직도, 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는 것을. 멀쩡히 오늘을 살아내는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
시인은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외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아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고 해도 치유의 첫 수순이 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저 시를 한번 보라. 시인은 병든 세계가 참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반대로 이 세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병들었음이 안타까운, 얼마나 귀한 세상인가. 여기는 삐딱하지만 귀여운, 순수하지만 씩씩한 아이들이 살아갈 귀한 세상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병에게[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21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11/09/9828240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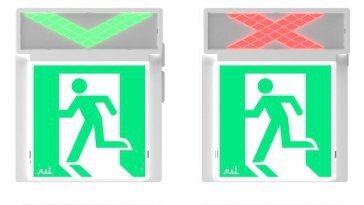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