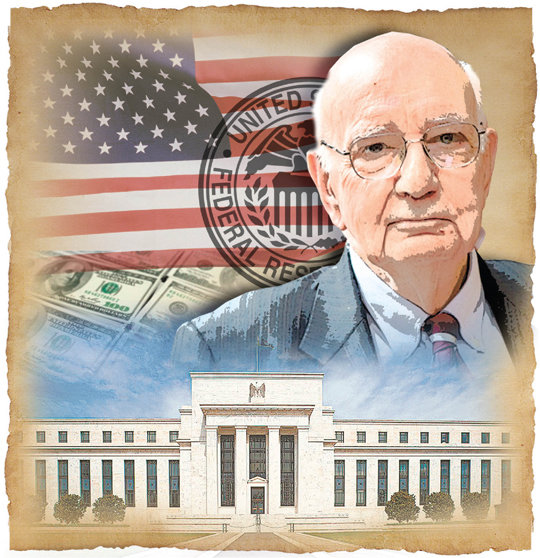

같은 해 10월 6일 토요일 밤. 초짜 의장 볼커는 돌연 취재진을 연준 본부로 불렀다. 주말인 데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해 전 언론이 교황만 쫓고 있었다. 한 방송사가 “사람이 없다”고 하자 대변인은 “안 오면 후회한다”고 했다. 볼커는 취재진 앞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용(龍)을 잡겠다”고 외쳤다.
8일 타계한 볼커 전 의장을 두고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한 일화는 그가 왜 ‘세계 최고 중앙은행장’으로 불리는지 짐작하게 한다. 오일쇼크 후폭풍으로 당시 미국은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시달렸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볼커는 과감히 물가 잡기를 택했다. 취임 때 11%였던 기준금리를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최고치인 20.5%까지 끌어올렸다.
진가를 입증했지만 백악관의 새 주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마뜩잖아 했다. 1984년 여름 볼커는 백악관의 호출을 받았다. 레이건과 제임스 베이커 비서실장은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집무실이 아닌 옆방으로 안내했다. 베이커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11월 대선 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원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볼커는 지난해 말 회고록을 통해 “원래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 하면 굴복한 듯 보일까 봐 답 없이 백악관을 떠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의장 임기를 두 달 남겨둔 1987년 6월 사의를 표했다. 레이건은 말리지 않고 후임자로 앨런 그린스펀을 골랐다.
볼커의 청렴은 그의 소신만큼 빛난다. 당시 볼커의 월급은 뉴욕 연준 의장의 절반 수준이었다. 연준 의장은 공무원이고, 지역 연준 의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뇨와 관절염을 앓는 아내, 뇌성마비 아들도 돌봐야 했지만 워싱턴행을 택했다. 워싱턴에 와서도 학생들이 사는 저렴한 주거지, 구겨진 값싼 양복, ‘말똥에 담뱃잎을 섞은 것 같다’는 싸구려 궐련을 고수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운전석이 다 부서진 낡은 포드를 몰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위 관료가 된 그는 이처럼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 두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갖가지 논란에도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공직이 어떤 소명보다 위대하며 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그에게 ‘도덕, 용기, 청렴, 지혜, 신중함, 봉사정신 등 로마 시대의 덕목을 갖춘 인물’(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삶 전체가 고귀한 이상으로 가득했다’(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등 찬사가 쏟아진 이유다.
말 그대로 사회의 심부름꾼, 즉 공복(公僕)이었던 그는 말년에 일신의 영달만 좇는 사복(私僕), 관의 이름으로 도적질을 하는 관비(官匪)가 넘치는 워싱턴 관가에 크게 실망했다. 회고록에서 “과거에는 공직자의 책임감이 투철했고 존경도 받았지만 그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아무도 정부, 대법원, 대통령, 연준을 존경하지 않는다. 공직자를 길러내는 엘리트 교육기관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니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지하겠나”라고 개탄했다. 어디 미국만의 일이겠는가. 또 공직자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하정민 국제부 차장 dew@donga.com
하정민 국제부 차장 dew@donga.com
글로벌 이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사설
구독
-

주애진의 적자생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아가자데’와 ‘나슬레 세봄’[글로벌 이슈/하정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1/22/9935247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