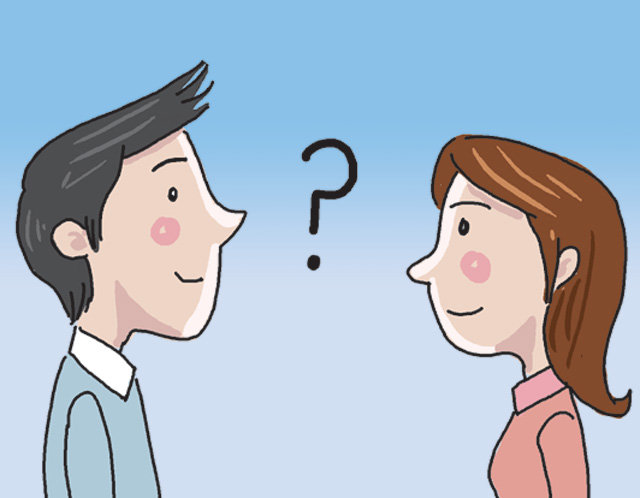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이상하다. 사자들에겐 ‘라이언 킹’이라며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하이에나들에겐 그러지 않는다. 표범이나 치타가 애써 잡아 놓은 먹이를 빼앗아가는 기회주의자라고 미워한다. 하지만 사실 먹이를 빼앗는 건 사자도 못지않은데 왜 하이에나에게만 이럴까?
예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에 갔을 때다. 막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넓은 초원을 달리다 생각지도 않게 하이에나 세 마리와 마주쳤다. 다큐멘터리에서 숱하게 봤던 녀석들이라도 눈앞에서 직접 보면 신기해서 카메라 셔터 누르기 바쁜데, 이 녀석들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녀석들이 내게 어떤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시들해져 버렸다.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일행 모두가 그랬다. 고정관념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녀석들의 모습이 한국까지 따라와 내 오랜 생각 하나를 바꿔놓았다. 웬만하면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던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지만 않으면 하는 게 낫겠다로 변화시켰다. 녀석들이 괜한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빈번할 수 있는 까닭이다. 더구나 우리는 무엇보다 얼굴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우리가 ‘당신을 본다’고 할 때 보는 건 팔다리나 몸통이 아니라 얼굴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역시 얼굴이다. 그래서 만나자고 할 때는 ‘얼굴 좀 보자’고 한다. 얼굴이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나쁜 일을 하는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얼굴엔 우리 마음도 나타난다. 43개의 얼굴 근육으로 1만 개가 넘는 표정을 만든다. 얼굴은 단순히 눈과 코 같은 감각기관을 모아 놓은 곳이라기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얼굴 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표정으로만 갖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웃 팀이나 상사에게 다가설 땐 안색 살피기가 필수인데 그러지 못하니 난감한 일이 속출한다. 사회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대면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모티콘을 만들어내 간극을 채웠다. 이번에도 소통의 빈틈이 커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표정을 대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서광원 인간자연생명력연구소장
서광원의 자연과 삶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기고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3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구더기도 쓸 데가 있다[서광원의 자연과 삶]〈1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4/27/10081432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