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개월이 지났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59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20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날까지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생활 방역’ 전환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총선 후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전제로 생활 방역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크고, 소비 둔화 등 위축된 경기를 방치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생활 방역은 아직 국민에게 낯설고 생소하다. 지금까지 실천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나 자가 격리와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다. 코로나19를 취재하는 기자도 헷갈린다. 날씨는 더워지는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챙겨야 할지, 생활 방역 단계에서 자제해야 할 ‘불필요한 외출’의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직장인은 “마스크를 쓰고 벚꽃놀이를 가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것 중 뭐가 더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 극단적 이동 제한 없이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킨 국민의 공이다. 적어도 이날 투표소에서 보여준 국민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일상도 큰 혼란 없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생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건 바로 정부의 몫이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현장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진영 칼럼
구독
-

기업 한류, K-헤리티지로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수능 본인 확인에 지문 활용해야[현장에서/한성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4/17/10069572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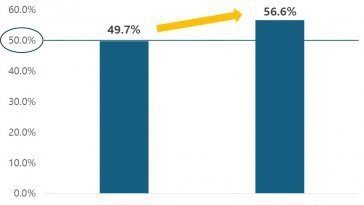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