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날 때 어렵더니 헤어져서도 괴롭구나./봄바람 잦아들자 온갖 꽃이 다 시든다.
봄누에는 죽어서야 실뽑기를 멈추고/촛불은 재가 돼서야 눈물이 마르지.
아침엔 거울 앞에서 변해버린 귀밑머리 탄식,/밤엔 시 읊으며 달빛 싸늘타 여기시리.
(相見時難別亦難, 東風無力百花殘. 春蠶到死絲方盡, 蠟炬成灰淚始乾. 曉鏡但愁雲鬢改, 夜吟應覺月光寒. 蓬山此去無多路, 靑鳥殷勤爲探看.) ―‘무제(無題)’(이상은·李商隱·812∼858)
어렵사리 이루어진 만남 뒤의 이별이라 그 체감은 더 절실했을 것이다. 훈풍의 세례 속에 활짝 만개했다 저무는 봄꽃처럼 우리의 인연도 가뭇없이 멀어져만 가는가. 그렇더라도 그대를 무기력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봄누에처럼 촛불처럼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안간힘을 다하리라. 그대 또한 초췌해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앉았을 것이기에, 밤늦도록 시를 읊조리며 달빛 속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기에 나 역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우두망찰하고 있다. 훈풍이 힘을 잃은 탓에 봄꽃은 스러져 가지만 우리 사이엔 희망의 메신저, 저 파랑새가 있지 않은가.
상징시 혹은 몽롱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상은 시의 구조는 그 층위가 복합적이다. 단선적인 해석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울 앞에서 변해버린 귀밑머리를 탄식’하는 주체는 시적 화자일까, 상대일까. 전설 속의 봉래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는 건 희망을 토로한 것일까,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함일까. 시적 화자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봄누에는 죽어서야 실뽑기를 멈추고 촛불은 재가 돼서야 눈물이 마른다”는 뭇 연인들 사이에 ‘사랑의 선서’처럼 애용되는 명구인데, 시인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스승의 희생정신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곧잘 인용된다.
이준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현장속으로
구독
-

고준석의 실전투자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아내의 속앓이[이준식의 한시 한 수]<5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5/22/101166139.1.jpg)

![[사설]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32258.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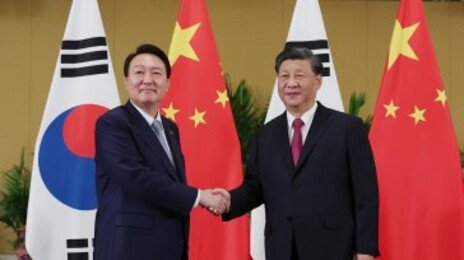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