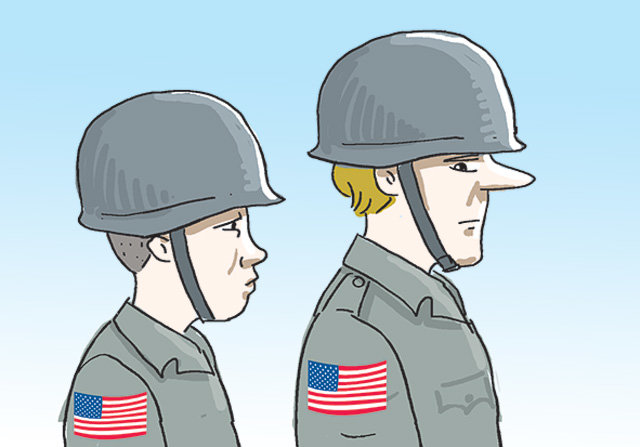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는 참신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상하게 한다. 조금 더 상하면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 병사들, 대다수가 미군이지만,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다가도 한국인의 근면, 총명함, 헌신적인 태도와 용기에 감탄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것이 백인우월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이 바탕에 깔린 편견인지, 당시의 솔직한 인상이었는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병사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할 뿐, 우리의 사정이나 배경까지 분석해서 쓰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석은 우리 사정을 그 병사보다 잘 아는 우리가 해야 한다. 분노나 변명이 아니라 냉철한 시각으로.
한국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록을 남긴 분들도 전장에서 만났던 개개인의 장병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거나 경의를 표한 경우가 많다.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어느 병사는 한국군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지만, 후퇴 길에 만난 한 카투사 병사에게는 참된 전사였다는 식의 기억을 남겼다. 개인은 훌륭한데 집단에서 평가가 박해진다. 사정은 있다. 한국군은 무장과 보급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내적인 문제라면 국가와 군에 대한 신뢰, 장교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국가는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전쟁을 겪으며,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자 한국군의 전투력은 빠르게 발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정신적인 신뢰, 전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든 군대든 조직에는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더 큰 위험 앞에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런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 신뢰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가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이 편을 나눠 상대에게 협박을 해댄다. 이제는 국력이 강해져서 이런 정도의 오만은 괜찮은 것일까? 인류의 역사가 가리키는 답은 “아니다”이다.
임용한 역사학자
임용한의 전쟁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밑줄 긋기
구독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임용한의 전쟁史]〈113〉](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6/09/101420739.1.jpg)
![그리스 경제 부활이 긴축 덕분?…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91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