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가운데 청와대가 큰 신경을 썼던 부분은 27일 만찬이었다. 점심은 ‘작전 타임’ 성격으로 남북 정상이 각자의 땅에서 따로 하기로 결정된 상황. 그렇다면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남측 땅에서 함께하는 식사 메뉴 선정이 더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사전 회의에서 만찬 메뉴로 옥류관 냉면을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냉면은 평양을 넘어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 그러나 참모들은 난색을 표했다. 옥류관이 있는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 아무리 면 따로, 육수 따로 공수한다 해도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찬 테이블에 퉁퉁 불은 냉면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옥류관 제면기를 판문점으로 가져오면서 냉면은 무사히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원래부터 냉면은 여름철 인기 메뉴였지만, 여권 인사들의 말마따나 그해 여름엔 “냉면집 앞의 줄이 더 길어진”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 냉면을 둘러싼 숱한 말이 쏟아졌고, 자연히 냉면은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4·27 정상회담 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냉면 맛있었느냐. 국물이라도 가져오지…”라고 했다. 당시 만찬에 보수 야당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한 걸 꼬집은 말이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말 폭탄’ 국면에서도 재차 냉면이 구설에 올랐다. 옥류관 주방장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 등장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두고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다. 반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냉면을 맛봤던 숱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냉면 먹은 합죽이’가 됐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불은 냉면이라도 먹겠다’고 한 건 임기 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 의지와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옥류관 냉면을 대접했던 북한이 돌변한 지금,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제대로 만들어 놓기는 한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사일과 핵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상대에게 무작정 대화의 손만 내미는 게 맞는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직 문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여름이 남아 있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 풍향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소소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부동산발 지지율 위기와 ‘도그 휘슬’[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7/07/10184795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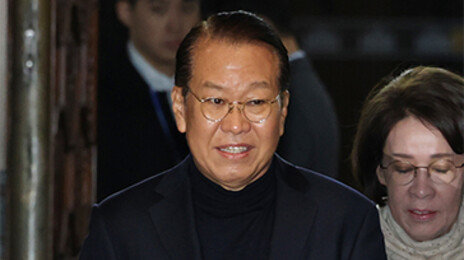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