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시장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유럽 출장 때마다 지역 책방을 돌아다니며 사 모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방대한 양의 책 중 상당 부분은 인권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유럽의 인권사부터 세계 각국에서 인권 사건 변호를 다룬 법률 서적도 즐비했다. 접견실 바로 옆에는 서재가 있었다. 사실상 ‘박원순 인권 자료실’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신 교수 사건 등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던 인권 사건들의 재판 기록과 변론을 뒷받침했던 자료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 전 시장은 몇몇 기록을 직접 꺼내 펼쳐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는 박 시장의 공관에서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박 전 시장의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과였다. 다른 한편으론 공관 전체가 마치 위인전을 보는 듯 박 전 시장만의 관심과 업적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고, 스스로도 상당히 심취해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지금 돌아보면 자신에게 지나치게 도취된 상태에서 3선 서울시장의 힘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11개월 뒤 벌어질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당헌당규의 굴레를 벗어날 방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설령 후보를 내더라도 자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사건 자체가 민주당 후보에겐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인사들이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거나 당 명의로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속내도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은 애써 외면하면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얼굴만 부각시키는 데 이르렀다. 반대로 통합당으로선 성추행 혐의가 되도록이면 생생하게 만천하에 알려져야 선거에 유리해졌다. 통합당에서의 박원순은 ‘권력형 성범죄자’의 얼굴만 가지게 됐다.
다른 경우지만 백선엽 장군의 별세를 놓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도 공식 애도한 6·25전쟁 영웅의 타계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백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적어 넣었다. 이에 야당 인사들은 “현 정권 지지 기반인 종북세력과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며 보수세력을 자극했다.
인물 평가에 100%의 정답은 없겠지만 여야가 오로지 다음 선거와 지지 기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코가 꿰어 역사와 인물의 양면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 국민을 편 가르고 이간질할 권리는 없다. 우상화된 권력자와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교차했던 서울시장공관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면, 죽은 자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명명백백히 밝힌 뒤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정치권의 할 일 같다.
최우열 정치부 차장 dnsp@donga.com
여의도 25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野黨의 자격[여의도 25시/한상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8/11/102393587.1.jpg)

![[오늘과 내일/서영아]한 시대가 끝난다는 것](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59268.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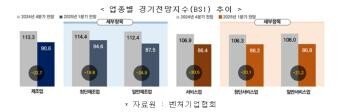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