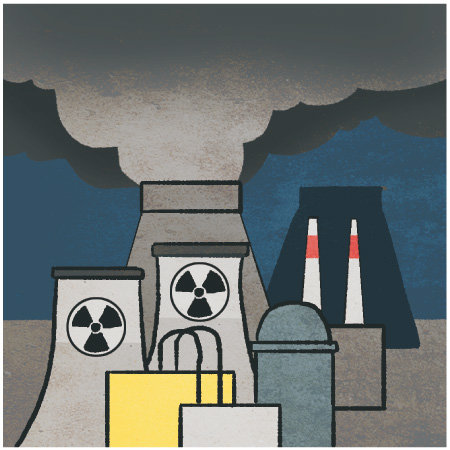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창고에서 수수 한 자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정원에 뿌리면서 말했다. “하느님의 새들을 위해.” 그러고는 달걀을 모아서 마당에 던지며 말했다. “우리의 개와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각종 씨앗을 꺼내 텃밭에 뿌리며 말했다. “땅에서 살아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향해 절을 했다. 창고와 사과나무 하나하나를 향해서도 절을 했다.
자신의 삶을 일굴 수 있게 해준 것들에 대한 고마움에서였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정든 집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으니 오죽했으랴. 강제 이주는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인류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문이었다. 그들의 집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 남단에 있었다.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이, 심지어 사람마저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나며 보여준 이별의 몸짓은 아이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아이가 끄집어낸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처럼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기록하는 일에 삶을 바쳤다. 그가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고전적인 의미의 작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인간이 만든 대참사 앞에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 감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비극이나 참사 앞에서 예술은 거의 언제나 무기력하거나 불충분했다. 그래서 알렉시예비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담는 커다란 귀”가 되기로 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고 극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목소리 소설’이라고나 할까. 약자의 상처와 고통, 눈물에 귀를 기울이라는 문학 본연의 책무에 이보다 더 충실할 수는 없다.
왕은철 문학평론가·전북대 교수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2030세상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선의 슬픈 과부[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5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8/26/1026488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