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남해독일마을로 이주한 파독 광부와 간호여성들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는데 맛의 기억은 또렷해졌다고 말한다. 한 파독광부는 “혀의 기억은 머리나 가슴의 기억보다 오래갑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필자가 부산고갈비 골목을 조사할 때 주인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고갈비 골목은 1970, 80년대에 단골이던 대학생들이 중장년이 돼 찾아옵니다. 그때는 고갈비를 냄새로 먹었고, 지금은 추억으로 먹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던 대학생들이 고등어구이 냄새에 이끌려 연기 자욱한 골목으로 몰려들었고, 지금은 그 시절을 회상하려는 사람들이 찾는단다.
파독 광부와 간호여성들이 말하는 맛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추억에 이끌려 부산 고갈비 골목을 찾는 사람들처럼 누구에게나 그런 음식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문화권에 따라 보편성을 지닌 맛이 있겠으나 맛에 대한 기억은 지극히 개별적이기도 하다. 필자에게는 ‘먹장어’가 그러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필자가 부산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이 먹장어다. ‘먹장어’라는 표준명칭보다는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에서 유래된 부산 사투리 ‘꼼장어(혹은 곰장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산이 연고지인 필자가 고교시절, 하교할 때면 전통시장 입구에 즐비한 꼼장어 점포 앞을 지나쳤다. 그때마다 꼼장어 굽는 강렬한 냄새에 침을 삼키던 기억. 갯내음 가득한 분위기와 탱글탱글하고 짭조름한 감칠맛을 알게 해준 자갈치 꼼장어 골목에 대한 추억 등.
꼼장어는 원구류(圓口類)로 편의상 어류로 분류하기도 하나 척추동물 중 가장 원시적인 수생동물이다. 흔히 접하는 붕장어, 주로 샤부샤부로 먹는 갯장어,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뱀장어와는 다른 종이다. 턱이 없고 수심이 깊은 바닥에서 물고기의 사체나 내장을 파먹고 살며 눈은 퇴화돼 피부 속에 묻혀 있다. 꼬리지느러미 외에 다른 지느러미는 없다. 먹이활동 없이도 2개월을 살 수 있고, 껍질이 벗겨진 채로 10시간 이상을 움직인다. 불판 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징그럽다며 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구우면 감칠맛을 한껏 머금는다. 소금구이, 양념구이, 짚불구이, 볶음 다 좋다. 꼼장어를 우리나라만큼 즐겨 먹는 지역은 없다. 세계에서 꼼장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산. 그곳에 단골집이 다섯 곳 있다. 그리울 수밖에.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바다가 기억하는 세 번의 아픔[김창일의 갯마을 탐구]〈50〉](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9/11/1028862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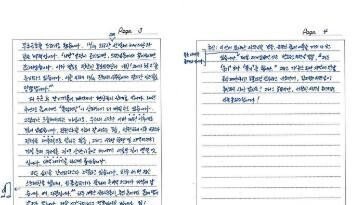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