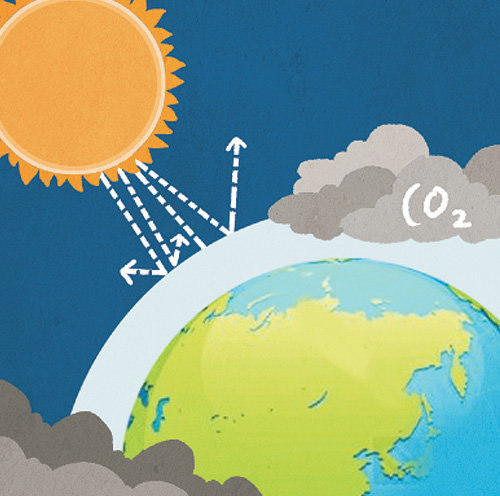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7월 아일랜드 대법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달에는 포르투갈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6명이 유럽연합을 포함한 33개국을 유럽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이들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단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규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엔은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 틀 안에서 작동하므로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강제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파리기후협약은 유엔 차원의 법적 규제를 지향하지만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실행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
유럽의 법 전통에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금언이 있다. NDC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유엔에 없을지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법 정신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Fiat justitia ruat caelum)’라는 금언도 있다.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하늘이 무사하지 못하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제 사회에 약속한 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날씨 이야기]지구가 불타고 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9/19/103006577.1.jpg)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9107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