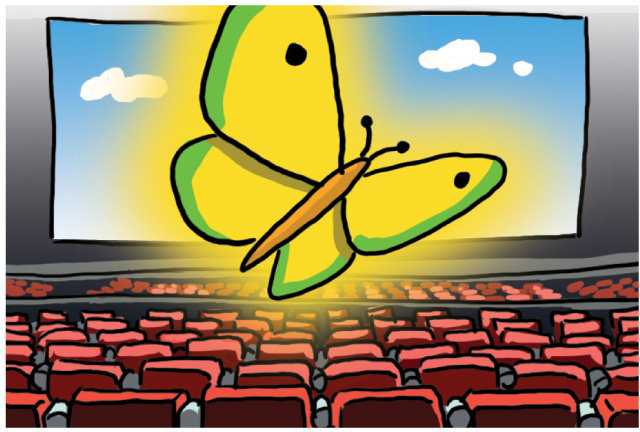

―정희진 ‘혼자서 본 영화’ 중
10년째 영화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 영화를 극장에 개봉시키기 위해 작품을 알리고,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일인데, 코로나19와 함께 예정했던 개봉작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화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깊숙한 두려움을 느낀다. 집 근처 극장으로 마실 나가듯 영화를 보던 일상, 보고 싶은 영화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며 족히 1시간은 걸리는 예술영화관을 찾던 간절한 기대. 디지털과 코로나19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은 일상이어서 소중했던 영화적 경험을 완벽하게 앗아갔다. 다정한 암흑 속에 일시 정지와 1.5배속 빨리 감기가 없는, 스마트폰의 알람 없이 온전히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이 사라지면 한 편의 영화가 깊숙하게 파고들어 오는 충만한 경험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화 안에서 더욱 삶을 버티고 살아내려고 한다. 나의 미약한 영역을 확장하고, 사랑하는 캐릭터들의 진심에 조금이나마 가닿고 싶으니까. 오늘은 집 근처 멀티플렉스도 좋고, 조금 멀리 독립예술영화관에 가보자. 아늑한 어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깊숙하게 만나고 이해해보려 애써보자. 영화와 인생이 서로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다.
최유리 영화홍보마케팅사 아워스 대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텅 빈 노트[내가 만난 名문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11/30/104203919.1.jpg)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