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유난히 슬픈 사람들이 많다. 장기화된 팬데믹에 가슴을 옥죄는 사건 사고까지. 울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어렵다. 감정을 지배하는 ‘디폴트 값’이 슬픔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기, 타인의 답안지를 참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나도 다음에 해 봐야지.’ 답안은 가지각색이다. 슬픈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내 경우에는 보통 여행을 가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슬픔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울고 자기를 반복한다. 끼니도 거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자고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면, 배가 고프다. 그 와중에 배는 또 고프다. 먹고 싶은 메뉴를 정성껏 골라 허기를 채우고, 다이어리를 펼친다. 감정의 잔해를 쏟아내다 보면 다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다. 괜찮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손바닥만 한 페이지 안에서 분노와 타협, 좌절과 극복을 반복한다. 다만 한 가지 꼭 지키는 것은 그 끝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도, 아직 괜찮다.’ ‘그래도, 다시 힘내보자.’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했다.
슬펐던 어느 출근길, 나보다 더 슬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쓴 일기로 글을 마무리한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투쟁 중이다. 고민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불안하지 않은 이 없으며, 우울을 모르는 자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 없다. 산다는 것은 마음을 붙드는 일인지도. 간헐적 기대와 행복에 기대어 불안, 우울과 더불어 사는 과정인지도. 내가 나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덜 아픈 마음이 더 아픈 마음을 끊임없이 보듬고 붙드는 여정인지도.’
다행히 오늘은 나의 총량에 여유가 있다. 기꺼이 듣고, 그 어느 날 기꺼이 기대겠다.
김지영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랩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2030 세상/정성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1/26/10510824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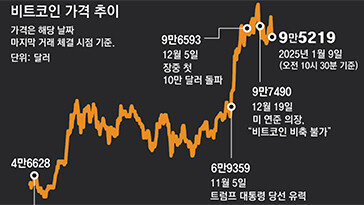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