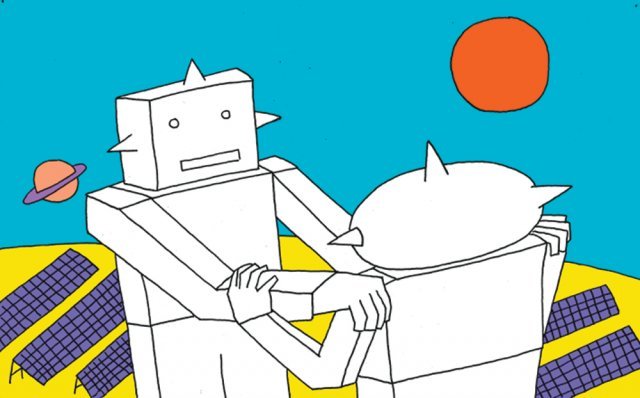

몇 년 전, 30대 때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전파공학연구소에 들렀는데, 머무는 동안 ‘아직도 이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감탄을 한 적이 있다. 세상 한구석에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렵고 필요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치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연구를 속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도 했다.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마치 패션처럼. 한 사람이 새로운 결과를 내면 우르르 많은 학자가 그 뒤를 좇는다. 첨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1886년 빌헬름 뢴트겐이 X선을 발견한 첫해에 1000편의 X선 관련 논문이 나왔다. 추산해 보면 당시 대략 1000명의 물리학자가 지구상에 있었던 시절이었다. 정작 뢴트겐은 두 편의 X선 관련 논문을 썼을 뿐이다.
태양전지 연구의 시작은 18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에드몽 베크렐은 빛 에너지를 금속에 비추면 전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광전효과’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는 태양전지 연구의 디딤돌이 됐다. 1887년에 하인리히 헤르츠에 의해 효율 2%의 광전효과 셀이 발명됐으며, 1954년에 이르러서야 효율 4%의 태양전지가 만들어졌다. 효율 2%를 증가시키기 위해 거의 70년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8년에는 미국 뱅가드 위성에 의해 태양전지가 위성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에 폭발적으로 커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오일쇼크’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한몫했다. 태양전지에 대한 열망은 15∼20% 효율의 태양전지 개발로 이어졌고,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25% 이상 효율을 내는 태양전지가 등장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나 싶은데, 신기하게도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프 페롭스키가 1839년에 발견한 광물이다. 180여 년 전, 그 시대에 페롭스키는 과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존재를 꿈에나 꿀 수 있었을까?
산업화의 물결로 에베레스트 정상만을 오르기 위해 경쟁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베이스캠프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이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물리학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데이터 비키니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체크인! 우주호텔[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3/19/10595388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