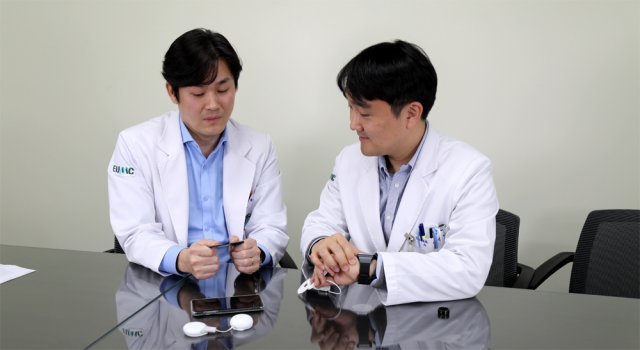

갤럭시워치와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하면 본인의 심전도와 혈압, 맥박, 스트레스,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 징후를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 측정으로 심방세동의 위험을 감지해 조기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웨어러블 장치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왔다. 침대 매트리스에 깔아 두는 수면 모니터링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수면건강 정도를 의사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파악할 수 있다. 또 허리띠 모양의 웨어러블 장치는 비만도 측정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배변습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식사 시 배 둘레 변화를 허리띠로 감지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면 허리띠를 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까지 측정된다. 이처럼 병원에서 단발성으로 얻은 데이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얻는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체크를 위한 웨어러블 장치가 나왔다. 과거에는 바늘을 찔러 혈당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늘 없이 해당 부위에 접촉만 하는 걸로 혈당 체크가 가능하다.
현재 나온 웨어러블 장치들은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기술력도 있지만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환자의 데이터가 바로 전송돼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진단이 이뤄지고 바로 병원에 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갖춰졌다.
웨어러블 장치는 환자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유익한 도구이지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병원의 생태계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웨어러블 장치로 김 씨를 살린 이대목동병원 심장내과 박준범 교수는 “웨어러블 장치의 실시간 활용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해결돼야 한다. 만약 책임 소재가 의료진에 있다면 부착형 의료기기를 처방한 의료진은 중환자실과 같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dongA.com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방역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자[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2/25/105601473.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