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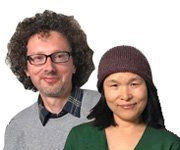
언제부턴가 레돔의 손이 천천히 커져 갔다. “어, 손이 왜 이렇지?” 레돔은 가끔 자기 손을 만지고 들여다보며 놀라워한다. 손바닥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손마디에 옹이가 생길 듯 말 듯하더니 이윽고 굵직해졌다. 손등 피부도 거칠거칠해지면서 소나무 껍질을 닮아 가고 있다. 더 이상 노트북 들고 회사 다닐 때의 섬섬옥수, 희고 부드러운 손이 아니다. 신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 끼었던 가죽장갑이 꽉 끼어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이 셔츠도 이젠 못 입겠어.” 지난해까지 잘 입었던 셔츠도 너무 작다고 한다. 손과 발만 큰 것이 아니라 어깨도 커져 버렸나 보다. 이럴 수도 있나? 그런데 셔츠뿐만 아니라 바지도 못 입겠단다. “이건 너무 크다.” 어머나, 다른 건 다 커졌는데 허리는 줄어버렸다! 셔츠는 어깨가 조여서 못 입고 바지는 허리가 줄줄 내려와서 못 입게 되었다.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든 지 4년 차, 주인도 모르는 사이 몸이 달라져 버렸다. 하루아침에 변했다기보다 매일매일 싸락눈이 쌓이듯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을 것이다.
간신히 시동을 걸어 언덕을 올라갈 때면 나는 늘 조마조마했다. 농부 아내 4년 차인 내 심장은 호두처럼 쪼그라졌을 것이다. 돌들이 튀기면서 이마를 찧고 나사가 빠지면서 기계가 언덕에 나뒹굴었다. 사과 궤짝 같은 것들을 트럭에 실을 때도 쉬워 보이지 않았다. 끈을 당겨 묶을 때면 낑낑 소리가 났다. “어허, 이 노끈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확 당겨서, 이렇게 여기 꽉 찔러 넣으면 절대 안 빠져!” 늙은 농부님은 줄을 확 당겨서 감더니 한 번에 고정시키고 손을 탁탁 튼다. 이뿐만 아니라 이분은 20kg이 넘는 사과 궤짝도 번쩍번쩍 들어서 올리고 내린다. 겉보기에는 깡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연세가 칠십 중반이다.
이분은 우리가 낑낑댈 때마다 망토를 날리며 날아오는 슈퍼맨처럼 어디선가 빠르게 나타난다. 맘씨 착한 중학생인가 싶게 작고 마른 남자, 가까이 와서 보면 얼굴에 온통 시커멓게 주름이 잡힌 농부다. 무거운 기계를 일으키고 밝은 눈으로 나사를 찾아 끼우고, 시동도 한 번 만에 걸어 버린다. “우와, 지구인의 친구 멋지구나 멋져, 할부지 슈퍼맨!” 내가 감탄하면 그는 소년처럼 웃으며 손을 들어 보인다. 홀쭉한 몸에 비해 두껍고 거칠고 시커먼, 관록이 느껴지는 커다란 손이다. 그러니까 힘은 몸이 아니라 저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농사를 짓는 긴 세월과 함께 자라고 거칠어져 슈퍼맨이 된 저 손.
그렇게 싸락눈이 쌓이듯 레돔의 몸도 조금씩 변해 가는 중이었다. 어딘가는 홀쭉해지고 어딘가는 근육이 붙고 어딘가는 두껍고 거칠어졌다. 언젠가는 늙은 농부처럼 날렵한 몸에 튼실한 손을 가진 남자가 되겠지. 밭에 가면 낫도 되고 호미가 되지만 사랑을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만능의 손을 가진 남자, 그렇게 농부가 되어 가나 보다.
※ 프랑스인 남편 도미니크 에어케(레돔) 씨와 충북 충주에서 사과와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신이현 작가
포도나무 아래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당신은 2월 같은 여자[포도나무 아래서]〈73〉](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2/16/105432993.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