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 결과는 총체적 경계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감시장비 운용부터 초동조치와 보고, 경계시설물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귀순자가 해안으로 올라와 처음 발견될 때까지 3시간 넘게 경계망은 뻥 뚫려 있었다. 첫 보고도 30분 넘게 지연됐다. 귀순자가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작년 7월 탈북민의 ‘배수로 월북’ 이후 일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계 실패가 상황실 간부와 영상감시병, 위병소 근무자의 잘못 탓이라지만 군 전반에 만연한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근무 장병들은 두 차례의 경보음마저 오작동으로 치부했고, 최초 식별 이후에도 부대 간부일 것이라며 조치를 미뤘다고 한다. 군 내부의 긴장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상태에서 ‘별일 아닐 텐데 괜히 부산 떨지 말자’는 안이한 인식까지 겹쳐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군의 대북경계는 과학화경계시스템 같은 감시장비에 맡겨지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경계심이 이완된 상태에선 어떤 경보음도 귀찮고 성가신 소음일 뿐이다. 군은 이번에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고 볼 일이지만 군이 무너진 기강부터 다잡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잠재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은 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2/13078083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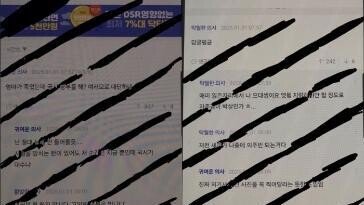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