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게 입증되는 집합제한업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된다. 1인당 지원금은 3차 때의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지급 기준이 매출이다 보니 2019년 하반기에 창업해 매출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 연간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불만이 크다.
“가게 문 안 닫으려고 손해 보며 장사했더니 작년 매출이 조금 늘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매출이 조금 줄어든 사람과 많이 준 사람을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나온다.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때에만 200만 원을 지원받는 26만4000여 여행·공연업주들은 지원금 차별이 불만이다. 국내외 여행이 사실상 ‘강제’ 중단돼 일을 못했는데 500만 원 받는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400만 원 받는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보다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없고, 세금도 안 내던 노점상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면서 소득 및 매출 증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7/1312262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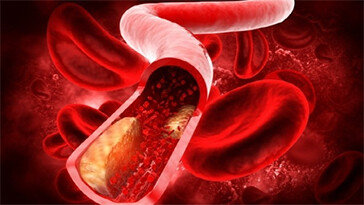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오늘과 내일/박용]](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26303.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