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 한 번 사연이 소개된 적도 있었다. 동경하는 DJ에게 나의 감정이 전달되는 것, 매체를 통해 나의 활자가 송출되는 것은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었다. 사춘기 시절 마음의 생채기도, 시험기간 심신의 고됨도 라디오가 주는 위로와 함께 극복했다. 그 따스함이 좋아서, 막연히 언젠가 한 번쯤은 DJ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미디어를 대체하면서 물리적 매체로서의 라디오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 포맷은 팟캐스트로 계승됐지만 어쩐지 더 이상 그 맛이 살지는 않았다. 실시간성이 컸다. 기존의 라디오가 실시간성을 기준으로 다시 듣기를 옵션으로 제공한다면, 팟캐스트는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는 재현성을 기준으로 라이브를 옵션으로 제공했다. 소통의 감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라디오는 한동안 삶에서 잊혀 갔다.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내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기치가 있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IT와는 상극에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면접용 구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명감을 부여하고 싶었다. 영화를 안 보던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책을 안 보던 사람이 전자책으로 책을 보기 시작하던 때였다. 내가 하는 일이 결국 디지털이라는 차가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보다 따뜻하게, 감성적이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구호는 통했다.
그런 의미에서 클럽하우스의 열풍이 새삼 반갑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잊었던 혹은 몰랐던 대화의 위로를,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거기다 원한다면 누구든 언제든 DJ가 될 수 있는 라디오라니. 다음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나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김지영 한화생명 신사업부문 마케터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롤린과 IPTV[2030세상/박찬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3/30/10614592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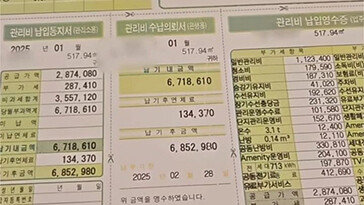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