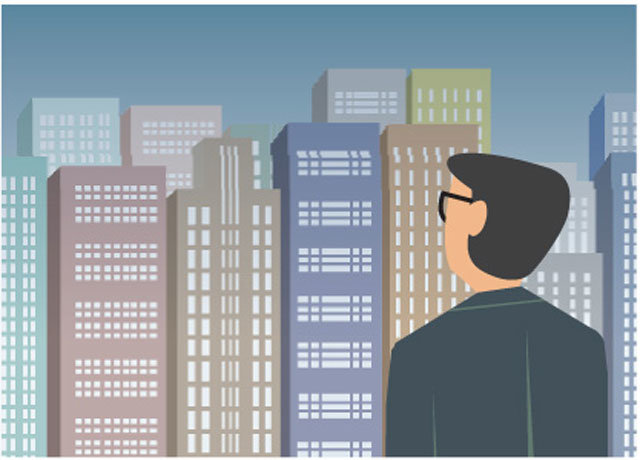
크게 보면 회의나 냉소는 관심의 역설적 표현이다. 관심이 없으면 굳이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일 필요도 없는 거니까. ‘건축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함성호 시인의 연작시에서 엿보이는 회의와 냉소도 그러하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겉만 번드르르한 수입 완제품이다. “서울은 광난다―누가 이렇게 밤새 서울을 닦아놓았나/번쩍번쩍합니다, 수입 완제품인 서울.” 서울을 두고 전면적인 수입품이라고 하다니 무슨 말일까. “거대한 욕망의 성채”처럼 보이는 건축물들, “네온으로 반짝이는 광고탑과 교회의 첨탑” “바벨탑처럼 높아만 가는 금융회사의 사옥”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이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수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없다는 말이고, 자기 것이 없다는 말은 철학도 역사의식도 미학적 논리도 결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인에게는 그러한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라 세트다. 필요하면 세우고 필요하면 부수는 세트. 혹은 그가 다른 글에서 거듭 인용한 하이데거의 말대로 “영혼이 없는 컨테이너”. 이보다 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이 있을까.
시인은 왜 그렇게 비판적일까. 건축과 관련하여 전통의 단절, 역사의식의 부재를 얘기하고 싶어서다. 미학적 원리의 부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부재를 얘기하고 싶어서다. 건축물들이 그러한 부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다. 물론 이것은 너무 박한 평가이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식과 미학적 논리가 없는 건축가는 자본에 휘둘리는 기능공이나 지식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외면하기 어렵다. 건축가를 겸하는 시인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근대 건축을 대상으로 이처럼 신랄한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건축만의 일이랴. 정치, 경제, 교육,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문제일 터다. 열세 편의 시에서 엿보이는 회의와 냉소, 야유의 뾰족함이 작게는 건축, 크게는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찰의 소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서영아의 100세 카페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지하실의 아이[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86〉](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3/31/106166084.1.jpg)


![인류 지성 펼쳐낸 캔버스… 수학자의 칠판은 예술이다[책의 향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64963.4.thumb.jpg)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2021-03-24 19:37:42
오늘도 존엄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1-03-24 19:36:05
역사 의식을 가지며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