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트럼프식 깜짝 정상회담’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결국 막바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북핵 논의가 진전이 돼야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북 인식은 문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강조하며 만나자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비핵화 의지를 못 믿어 볼 수 없다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톱다운’ 해결에 집중하며 중재자까지 자처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실무회담을 우선시하는 ‘보텀업’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그에 맞춰 우리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수 있다는 ‘선순환 대화’ 집착에서 벗어나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우선 힘을 실어줘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7/131226208.1.jpg)

![목소리 잃은 ‘미국의 소리’… 미국의 적에게 주는 선물[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25827.2.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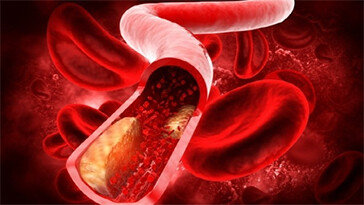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